‘설리법’은 차별금지법이어야 한다 - 위근우의 리플레이를 읽고

가수 최진리가 유명을 달리한 이후 논의되고 있는 ‘설리법’에 대한 위근우 기자의 글을 읽고 공유한다. 처음 포털에 갑자기 그녀의 이름과 함께 사망이란 단어가 붙어 떠있는 것을 보았을때 내 눈을 의심치 않을 수 없었고 (‘조국 사태’ 와 맞물려 온갖 정치적 싸움이 난무하던 때여서 어쩔 수 없이 포털 뉴스에 눈을 두고 있던 때였기에 비교적 일찍 발견했다) 평소 그녀가 받아내야 했던 그녀를 향한 쏟아지는 악플과 인신공격과 차별, 혐오를 대중이라는 이름에 묻혀 바라보아야 했던 나로서 어떻게 애도를 하면 좋을까 먹먹한 마음으로 그 동안의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그녀의 죽음 이후로, 고작 브래지어를 하지 않은 본인 사진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개인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한 악플러들은 본인들의 행위가 ‘차별’을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달았을까? 대체 왜 그녀는 혼자 모든 공격을 감수해야 했으며 수 많은 억측과 루머에 시달려야 했을까? 대중 앞에 서는 연예인 이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비극을 통해서 사회와 개개인은 어떠한 것을 배울 수 있는가, 배우지 못하는가 등에 대하여 고찰해본다.
위근우의 리플레이-'설리법'은 차별금지법이어야 한다 글 원본
평소 즐겨찾기를 해놓고 종종 읽는 위근우 기자의 리플레이는 사회적 이슈와 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등의 날카로운 비판을 담고있다. 그의 책 <프로불편러 일기>, <다른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이도 구매하여 모두 읽고, 정당한 비판은 무엇인가에 대해 성찰하고 배우고 있는 중이다.
이번 글에서 그는 ‘설리법’은 장못된 명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인을 괴롭힌 것이 단지 연예인에 대한 악플로만 규정되면 유독 여성 연예인에게 가혹한 잣대와 ‘여성혐오적 통념’ 의 문제가 지워지기 때문이며, 현재 논의 중인 인터넷 준실명제는 정치적 의견 개진의 자유를 위축시킬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설리법’이란 이름을 붙여 입법까지 밀어붙여 마땅할 ‘차별금지법’은 정작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혐오 생산과 확산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라는데에 백번 동의할 수 있는데,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을 ‘논란’이라 이름 붙이는 것과 끊임없는 논란이 재생산되는 현상이 과연 그에게만 일어난 일이였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 현재도 다수는 아무 이유없이 또는 차별을 바탕으로 특정 대상에게 온라인 공격을 가하고 있을 것이며 언제 또 이런 비극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만큼 보호받지 못하는 '대중의 관심'을 받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많다. 당장 논의되고 바뀌고 보호해야 할 개인의 권리에 대한 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는데에 분노와 안타까움만이 남을뿐..
간단하게 말해서,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나 준실명제는 혐오의 고리를 끊는 효과적 방법과는 거리가 먼 이유. 말하는 행위 전체에 대한 부담감을 늘리는 방식보단 단지 말이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폭력으로서의 ‘혐오발화’ 범위를 설정하고 금지하는 것이 더욱 ‘온당’하고 ‘효과적’ 이기 때문이다. 기자는 표현의 자유 전체를 위추갛기보단,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없는 발화 자체를 걸러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논의의 중심을 악플에서 혐오발화로 옮길 때의 장점이란 ‘사회적 차별’이라는 맥락에 근거하고, 실존적 삶을 억압하거나 위협하는 발화를 구분할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데에 존재한다. 차별주의자들과 그 동조자들이 원하는 것은 한 개인의 자주적 삶을 일탈로 규정해 그 개인이 속한 특정 범주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또 배웠다. 차별적 통념이 이 전제에 깔린다. 그렇기 때문에 ‘설리법’은 차별금지법 이어야 한다는 것.
차라리 기사에 달린 맥락을 무시한 혐오 발언 댓글을 보지 않았으면 했었는데, 역시나 댓글창 폐쇄 역시 혐오발화의 맥락에서 검토할 때 더 강한 정당성을 얻는다고 한다. 혐오가 난무한 글들을 난 읽을 의무가 없고, 읽고 싶지도 않은데 너무나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어렵다. 당장 포털 사이트 맨 위에 올라온 뉴스 댓글난(특히 여성관련 기사나 연예쪽 기사)를 하나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혐오의 배출구라 규정되는 데는 이유가 존재한다. 배출구를 넘어 혐오 장사로까지 확산하여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클릭과 공감을 유도하는 익명 집단의 힘에 기대는 불공정한 사회 통념 등을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것 등은 더욱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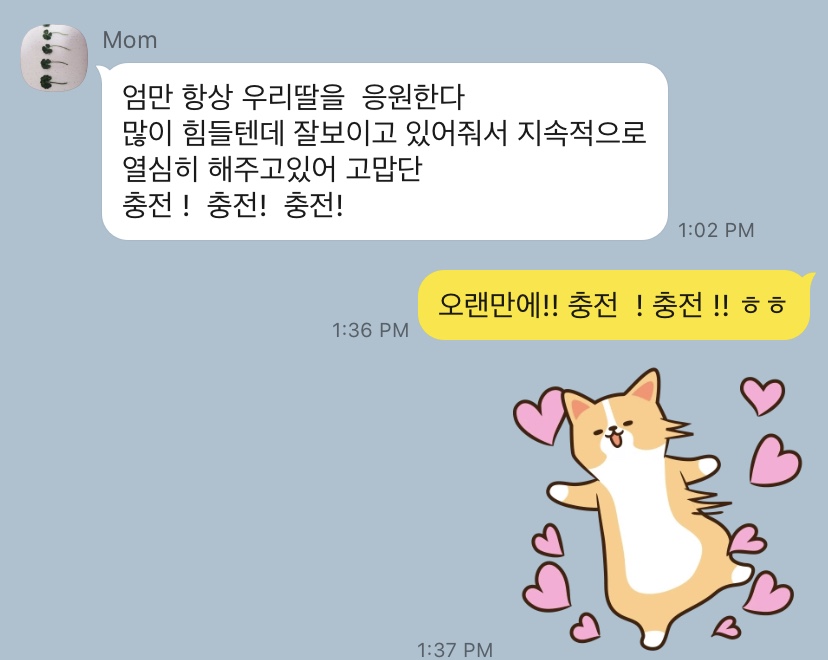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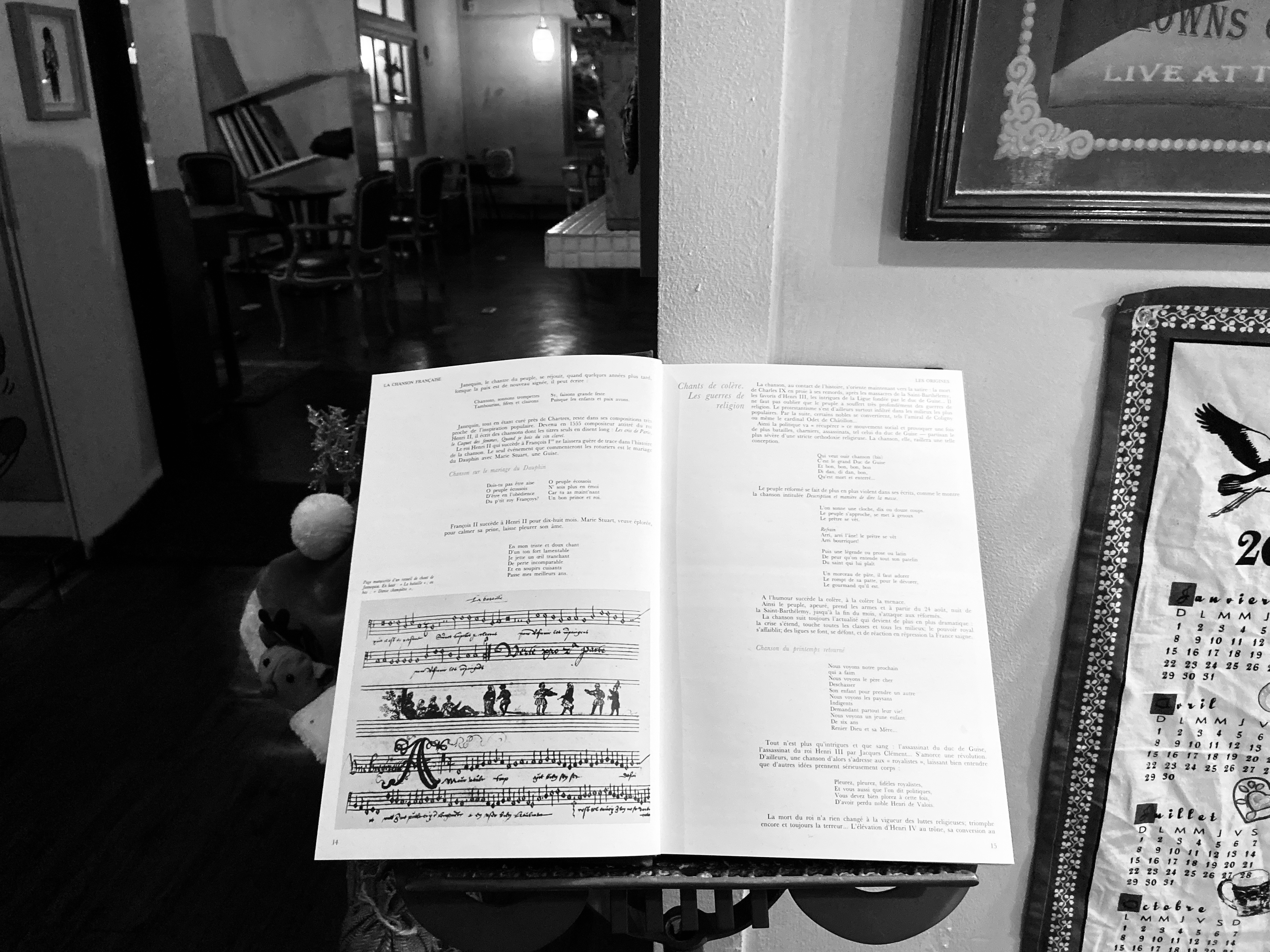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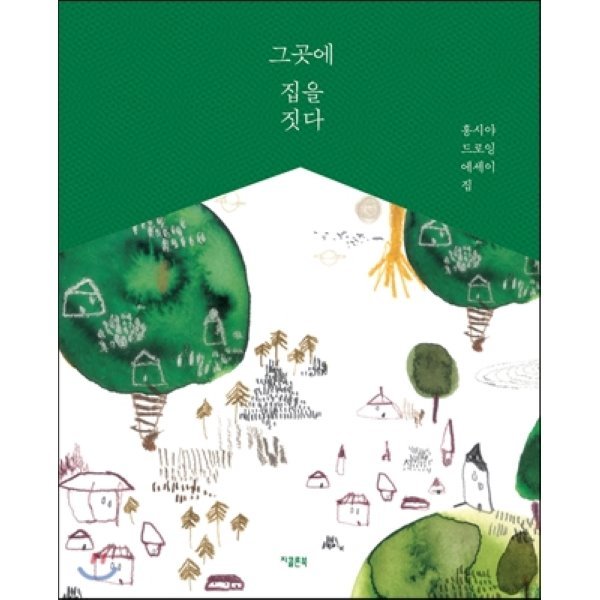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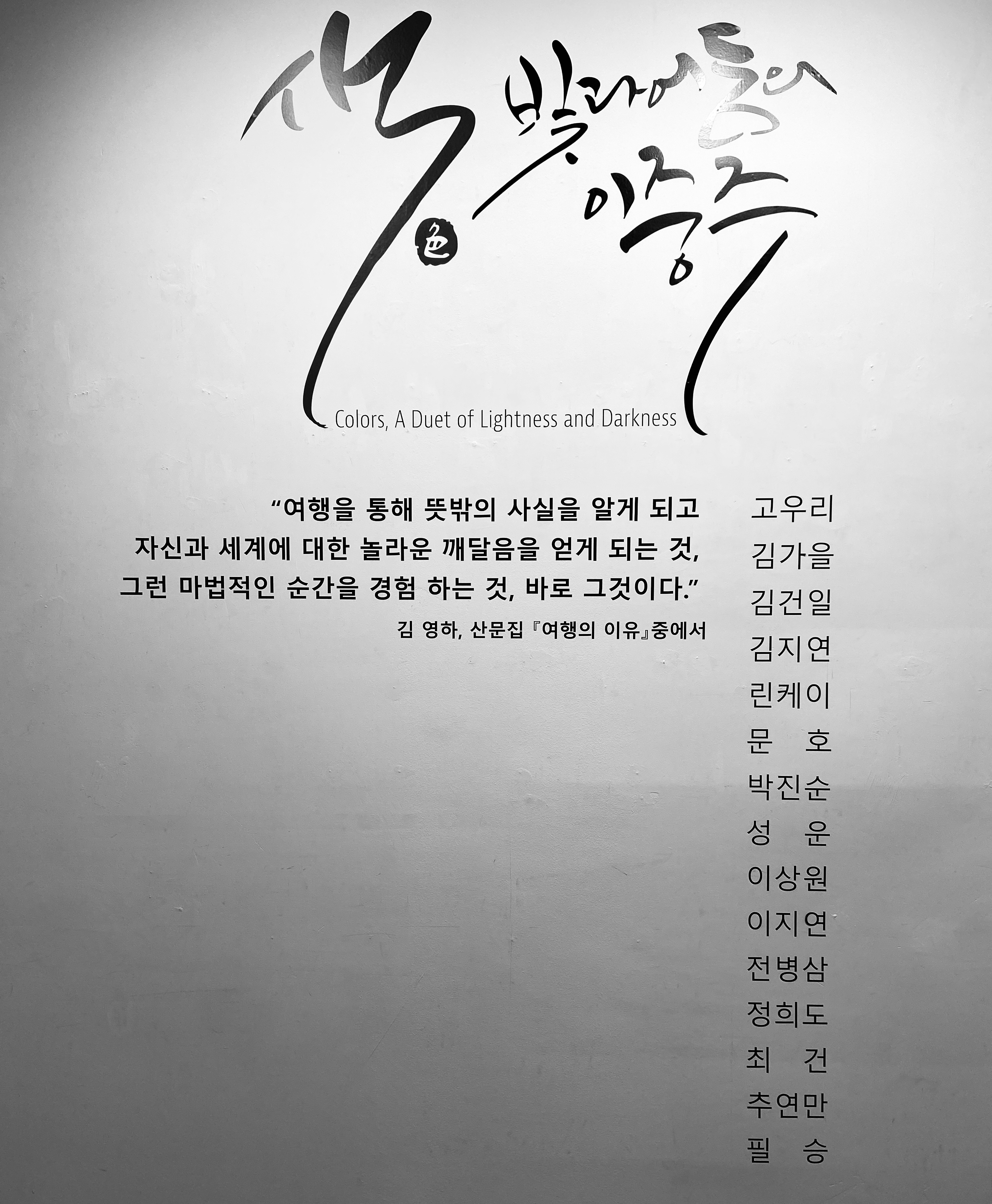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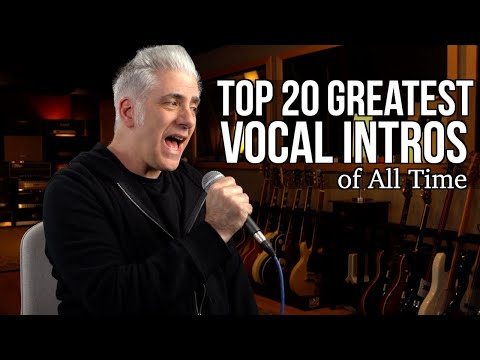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