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세이] 파리를 찾은 지인과의 대화

오랜만에 파리에서 조우한, 몇 년 전 같은 연습실을 쓰던 지인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기타를 치는 그는 그동안 쌓아온 멋진 고찰들을 곡으로 발표했고, 멈추지 않는 재즈에 대한 열정과 음악에 대한 사랑은 여전했다. 그의 감정적이면서도 멋진 선율의 기타 곡은 지금 내 플레이리스트에 고이 저장되어 이따금씩 틀어지고 있다. 섬세하면서도 묵직한, 그의 성품과 닮아있는 듯했다. 꺄미노 길을 걸을 계획을 짜고 파리를 잠시 머물던 그는 짧은 시간 동안 나와 함께 파리를 누비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때를 떠올려 재구성해본 대화들을 적는다.
우리 그때 친했던 그 사람들 어떻게 지내? 연습실은 어떻게 되었어? 앞으로의 계획은 뭐야? 탐색전을 하듯이 몇 년간 묵혀온 얘기를 시시콜콜 꺼냈던 그날. 나는 그의 음악적 고찰을 들음으로써 다양한 사유를 안게 되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함께 걸으며 이 대화는 ‘방향성’이란 주제로 귀결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생각이 정리되어 이제야 글을 쓰는 지금, 그는 꺄미노 길을 걷는 중이다)
대뜸 질문부터 던지고 본다. 내 정서란 무엇인가? 음악에 녹아있는 나의 아이덴티티 ‘Identity’를 대중이란 매체 사이에서 어떻게 찾아야 할까? 궁극적인 목표란 무엇이고, 근원적 질문이란 무엇일까. 아마 음악으로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법한 주제일 것이다. 내가 찾은 근원적 지점이란 바로 ‘나 자신’과 가깝다.
강남순 교수는 살아있음, 즉 존재의 과제는 다층적 언어의 통로를 통해서 표현해 내면서, 자신, 타자, 이 세계에 개입하고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나의 언어로 타자의 존재를 소환하고, 소환된 타자들은 비로소 나와 연결되며 나는 이 세계에 개입하는 한 발을 내딛는 것이다. 나는 나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 내었고 앞으로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붙여보면 어렵지 않다. 늘 그랬듯, 실천이 어렵지.
‘어떻게 내 사유를 타자에게 전달할 것인가’는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나의 경우 음악으로든, 글로든 그 수용성과 가능성을 넓히는 중이라고 애써 다독거려도 늘 배움과 발전에 목말라 왔고 더 나아가선 ‘인정’과 ‘위치’에 집착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프랑스에서의 삶은 몇 년 간 나를 모든 것과 단절하기에 충분했고, 그 집착의 늪을 벗어나려면 (일단은) 유능해지는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서든 세상에 나를 내놓아야 했다. 하지만 짧고 단기적인 유명세는 나의 길이 아니었다. 화제를 모을 수 있는 자극적인 음악이나 글로는 오래갈 수 없음을 판단했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정체성과 맞지 않아 엄두가 나지 않았다. 자신의 삶의 주체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용기’를 찾고 싶은 것이지, 그저 반짝 뜨고 싶은 것과는 거리가 멀음을 깨달은 것이다.
공부를 하면서 배움 전에 요청되는 ‘탈 배움’을 내 삶에 조금씩 적용해온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이제까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처음으로 읽고, 사유하고, 배우는 것과 같은 위치에 높은 것은 쉽지 않은 과정임을 매일 느끼고 있다. 이제까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뒤집고 나의 공부, 주변 환경, 생각 모든 것들에 적용하는 것. 그중에 아직도 가장 힘든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음악’이다. 음악이란 무엇인지, 재즈란 무엇인지, 스캣은 왜 이렇게 배우는지, 왜 저렇게 표현하는지 등등... 누군가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나의 틀을 잡으려니 정형화되어 있는 딱딱한 벽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내 배움과 경험은 모두 가짜일까? 뭐가 나를 정의하는 걸까? 끊임없는 질문이 되풀이되고 아무도 대신 대답해주지 않는다. 사람들과의 대화나 글, 또는 위대한 뮤지션들의 앨범에서 동기부여를 찾을 순 있어도 결국 그 여정의 중심은 ‘나’에게 있어야 한다.
전엔, 나의 삶을 의미롭게 만드는 진정한 한 가지는 바로 음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얕고 좁은 나의 우물 안 음악세계는 산산이 부서진 지 오래고, 점차 위로가 되는 음악을 찾아 듣기 시작했으며 전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카테고리의 음악들이 귀에 들리고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표현방식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한 분야에 열정을 불살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 안에서 ‘나’를 찾아가는 것. 그게 삶 아닐까, 모두가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위로를 하며 매일 밤 외로움과 싸우는 수밖에.
그가 물었다. 여기서 혼자 공부하고 연주하고 지내면... 외롭지 않아?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니, 측은한 눈빛 세례가 나를 향하고 있다. 응, 외롭지. 그리고 참 다양해. 나를 규정하는 사회의 많은 것들을 깨고 나의 20대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거창하진 않지만 내 삶에 의미 있는 거거든 이라고 (아마도 비슷하게) 답했던 것 같다. 모두가 외로운 여기에서 내 외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는 지난 몇 년간의 간절함 덕분이다. 허세랑 던져버리고, 잘난 척 (특히 모르는데 아는 척), 가식으로 위하는 척 등은 진작 그만두었다. 진실로 나를 보여줘야 상대방과 진정한 0에서부터 시작한다.
사람들과 종종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소모적인-그리고 지치는-때가 (아주) 많은데, 그럴 새도 없이 그와 하루 종일을 걷고, 대화하고, 사진을 찍어주는 일일 가이드를 자처했다. 그는 고마워했고, 미안해했다. 하지만 누군가의 일생에 한번뿐일 수도 있는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 비록 그에겐 목표지점으로 가기 위해 거쳐가는 도시였을 뿐이라도 말이다.
때론 삶이란 연서 같다는 생각을 한다. 누군가와 진심이 담긴 연애편지를 주고받듯이, 내 삶에 모든 것과 치열하게 연애하듯 조우해야 하니까. 나의 정체성과 음악, 그리고 글. 별것 없지만 그 별것 없음에서 피어나는 진심이 언젠간 드러나리라 바라게 된 그와의 하루가 지난 지금, 난 여전히 이 도시에 머물고 있다. 작고 느린 걸음으로 성장하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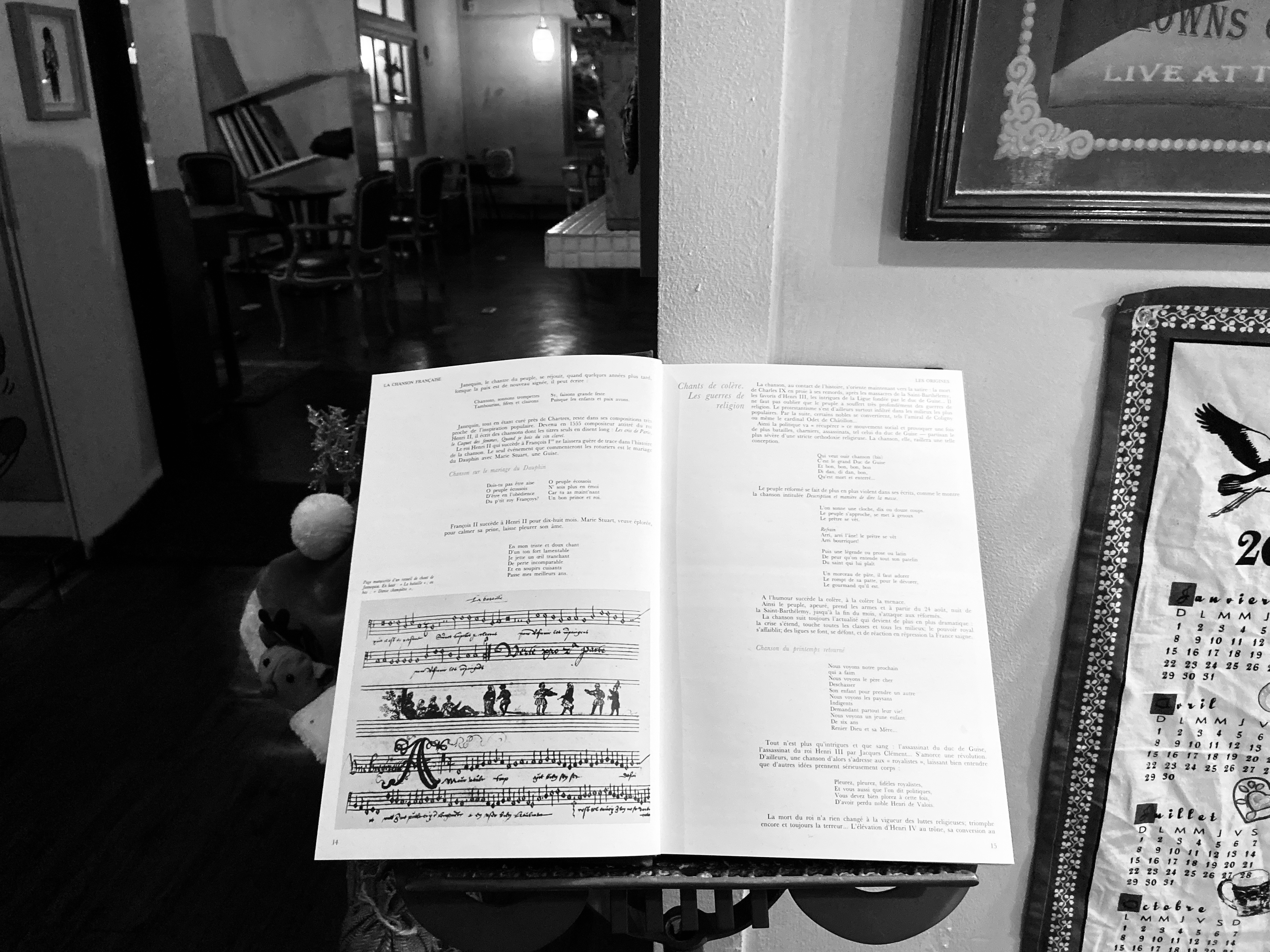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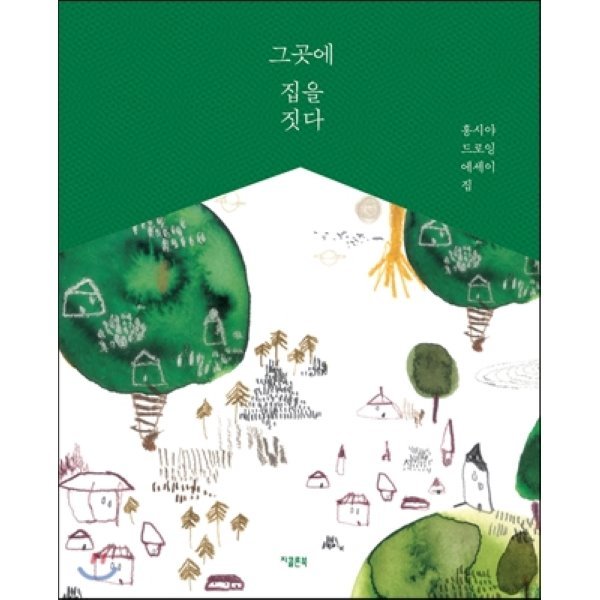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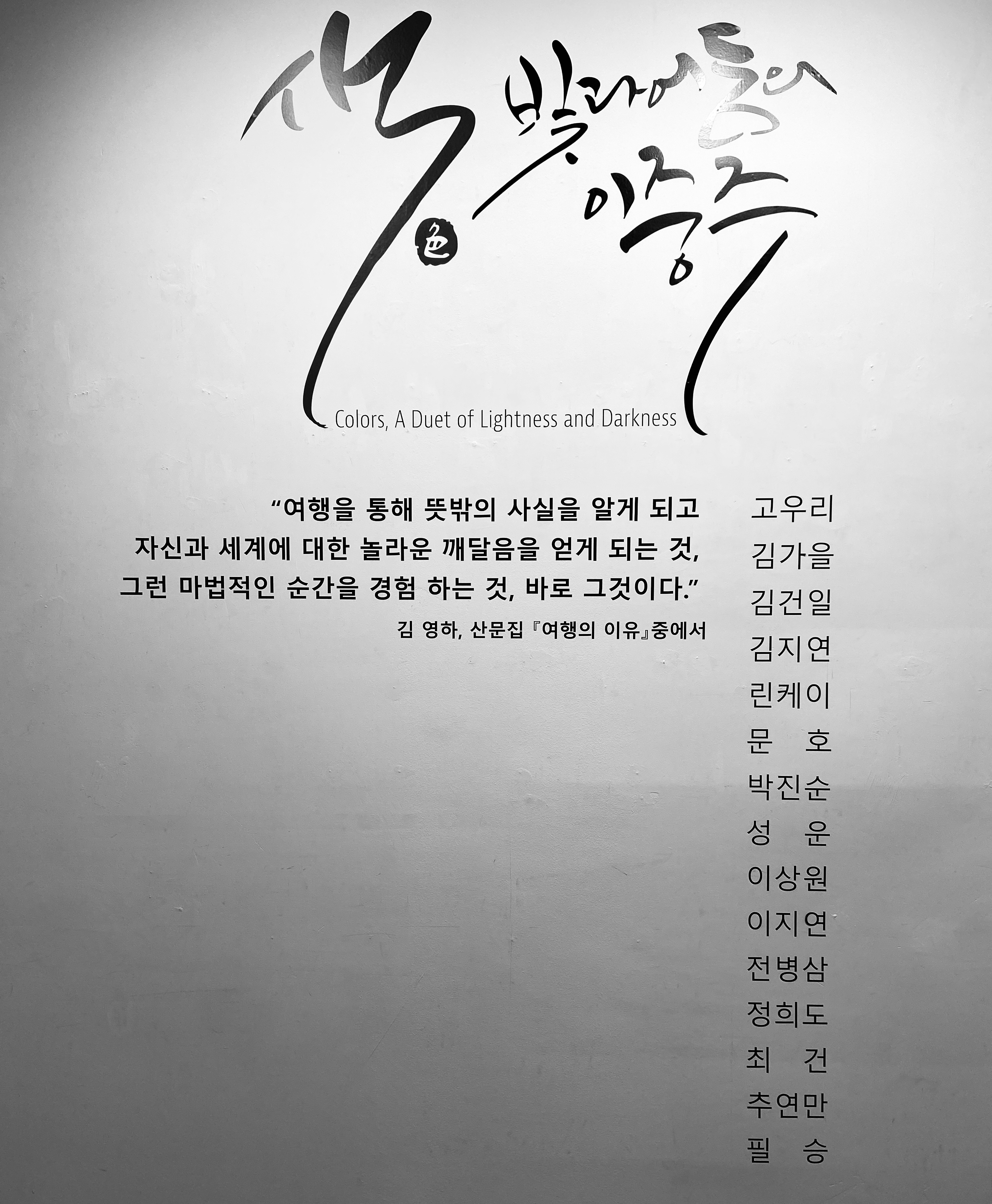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