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기록] 선의를 조우하기

서울은 참 넓은 도시. 타이밍이 좋지 않다면 차들의 소음으로 가득한 거리에 갇히기 십상인, 다양한 대중교통의 복합 집합소이기도 하다. 하루 종일 여러 일을 해내느라 진땀을 빼고 나니 저녁에 탄 버스 안에서 녹아내리던 날. 설상가상으로 공연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을지 간당간당한 불안한 상황이였다.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으나 월경증후근으로 인한 허리 통증은 심해져 얼굴이 이그러지고 있었고 양손 가득 든 짐을 든 팔은 점점 늘어졌다. 아, 내가 또 내 몸을 과대평가 했구나. 늘 반복되던 피곤함을 겨우 몇 해 지나갔다고 피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 것인가. 한심한 내 자신.
여름철 사람들로 가득찬 버스는 꿉꿉하고 매캐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 한마디로 움직이는 지옥이다. 에휴, 다들 힘들텐데 조금만 참고 가자 싶어 포기하고 흔들리는 차의 움직임에 몸을 맡기고 가는 중, 서있던 내 앞 좌석에 앉아있던 한 아이의 날 쳐다보던 시선이 느껴졌다. 갑자기 일어서며 앉으세요 하더니 저 멀찌감치 가는게 아닌가. 친구들과 같이 탄 모양새였는데 계속 날 신경쓰고 있었던 모양.
괜찮다며 거절하고 몇초 버티고 서있었건만 주위서 흘끔 흘끔 보는 시선에 얼떨결에 감사합니다.. 하고 자리에 앉았다. 순간 허리 통증이 짜릿하게 등 전체에 퍼져 아, 하고 짧은 탄식이 나왔다. 도착하려면 아직 몇 정거장 더 남았는데 이 민망한 상황을 어찌 해야할지 감이 안잡히는 도중, 저기 있는 그 아이를 슬쩍 살폈다. 회색 추리닝에 귀여운 파마를 한 얼핏보아 중학생 정도 되보이는 친구였다.
미안하고 고마운데 뭐라도 줘야하는거 아닌가 싶어 가방을 뒤적뒤적 살폈으나 그 흔한 사탕하나 없었다. 피식 웃음이 나왔다. 혹여 사탕을 건네기라도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까 싶고 마치 내가 어렸을 적 충분히 어른이 할만한 행동을 내가 자연스레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신기해서.
아쉽게도 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내 포기했지만 그 학생은 나의 간절하고 애타는(?) 눈빛 세례를 느꼈는지 나를향해 꾸벅, 인사까지 하더니 다음에 친구들 무리와 내렸다. 내리는 학생의 뒷모습에 대고 나도 얼떨결에 꾸벅 인사를 했다.
대중교통으로 움직이는 것이 익숙했던 지난 날엔 마음이 따듯해지는, 선의 가득한 양보의 현장을 목격하곤 했다. 종종 짐이 양손 가득한 허리가 굽은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가 타면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이리 와 앉으세요, 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기억 난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지긋하거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주로 버스) 타는 때 자리에 앉을 때까지 백머리로 지켜보시다 천천히 출발하는 버스 기사님까지 서울은 인정이 넘치는 면이 있었음을, 잊지 않고 있다. 마치 타인의 몸이 짐짝인것 마냥 밀치고 가는 어른들의 불편한 손길도, 다른 곳이 있는데도 임산부석에 당당히 앉는 남성들도 종종 조우하지만 말이다.
어떻게 세상 모두가 내 마음 같겠는가. 예상치 못한 선의도 불쾌한 마주침도 내게 주어지는 작은 일상 속 선물이라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것 아닐까. 다행히 돌아갈 집이 있음을, 함께할 인연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는 여행을 하는 중인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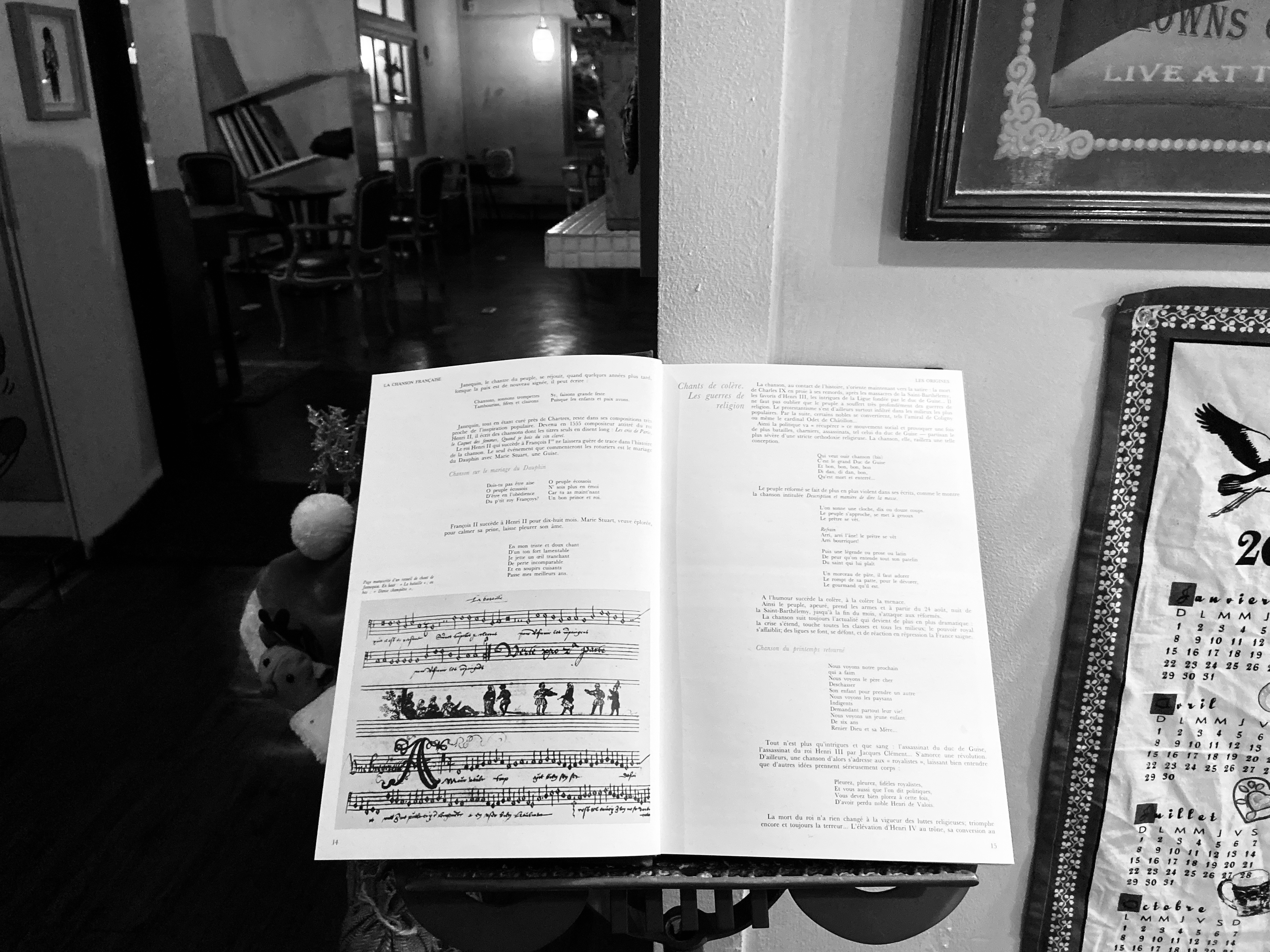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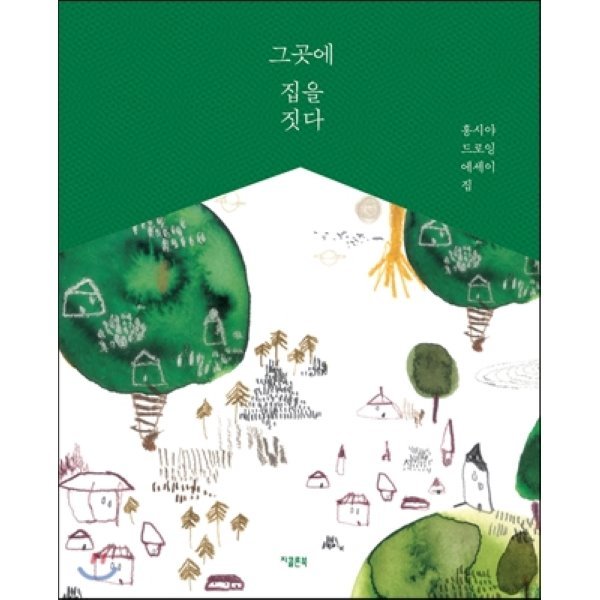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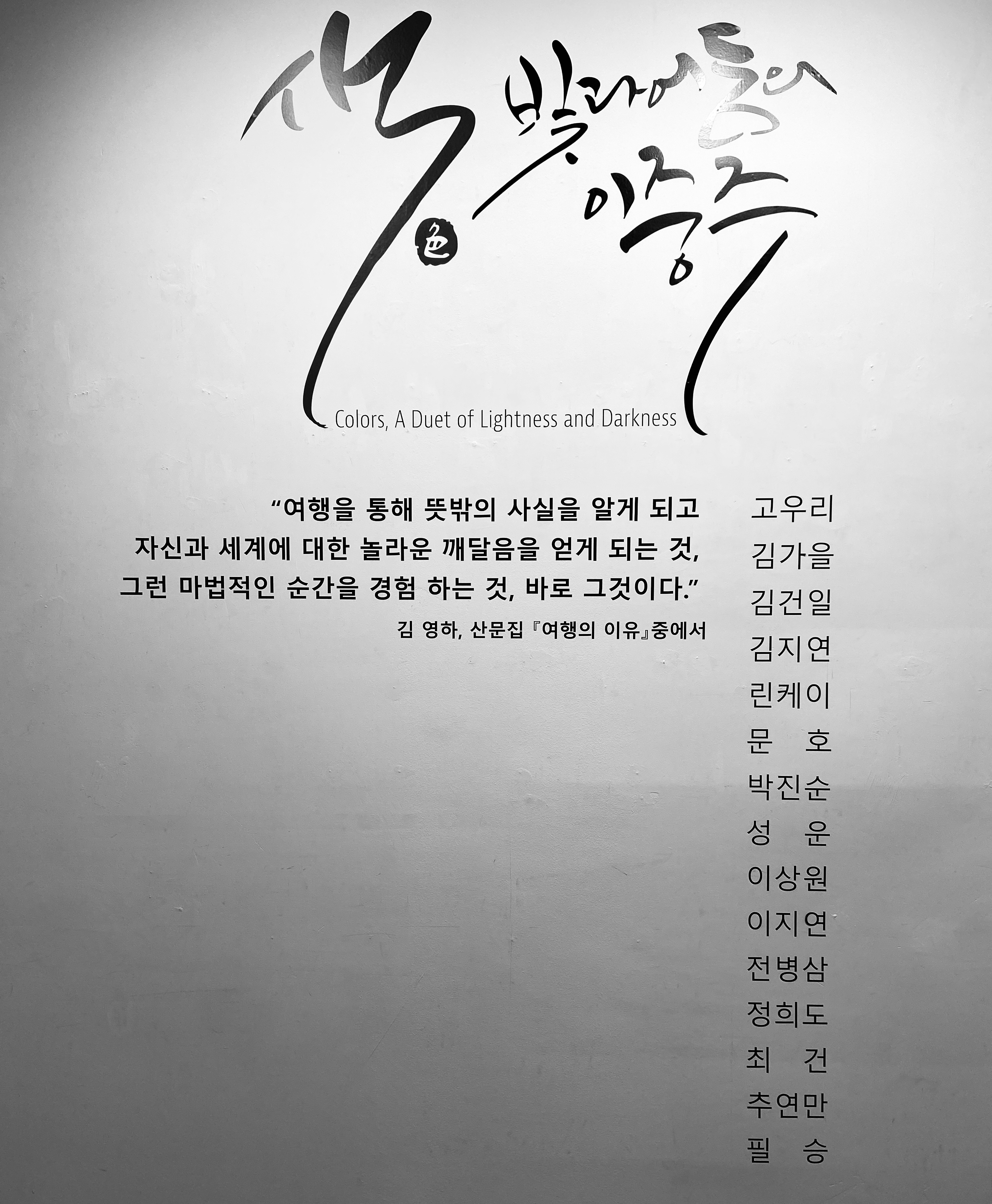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