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스웨터 하나 장만 하고 싶어지는 책, <아무튼, 스웨터>

스웨터처럼 옷을 입어온 시간에 따라 온의 기분이 달라지는 옷 또한 드물다. -코르덴과 가죽과 세무가 그런 부류다.- 오래 입어 보풀이 잡힌 스웨터의 엉뚱한 생기는 어떤 옷에서도 쉬이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스웨터의 종류와 기원 그리고 그 쓰임새와 쓰였던 시대적 배경까지, 다양하리만큼 그에 대한 애정이 빼곡히 적혀있는 귀여운 책, <아무튼, 스웨터>. 처음엔 (감히) 스웨터 하나로 이런 글들을 써내려 갈 수 있다니 대단하다 싶었다. 하지만 읽고나니 역시나, 저자 김현님의 간결하지만 따듯한 사유와 감정들로 나의 어리석음은 부끄러워지는 동시에 스웨터에 대한 없던 애정까지 슬그머니 머리를 내밀었다. 아무튼 시리즈를 추천하는 동시에 권유하고 싶은 책이다.
옷 한 벌 때문에 시작되는 연애가 있고 옷 한 벌 때문에 끝이 나는 연애도 있으며 옷 한 벌 때문에 두고두고 기억되는 연애도 있다. 모든 연애 얘기는 시간이 지나도 짜임이 느슨해지지 않는다. 옷장 속에 감히 ‘그 사람의 옷’이 한 벌쯤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지나간, 어쩌면 현재 진행형일 옷과 관련된 일화들을 붙잡고 이렇게 다정하게 글을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부러운 능력이다. 참 막막하고 아름다운 문장들의 집합체다.
기억에 남는 챕터는 ‘Christmas Sweater’. 이 챕터에선 ‘어글리 크리스마스 스웨터 데이’를 다룬다. 내 기억으론 12월 중순이었는데, 책에선 12월 셋째 수 금요일로 나온다.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에서 달시가 브리짓 존스를 처음 만났을 때 입고 있던 루돌프 스웨터를 떠올리면 된다. 그 날은, 우스꽝스러운-지극히 크리스마스 스러운-스웨터를 입고 모여 파티를 하는 날이다.
미국에서 여러 기념일 (national, personal)을 보내왔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딱 두가지. 할로윈과 어글리 크리스마 스웨터 데이였다. 나에게도 알록달록하고 우스꽝스러운 스웨터가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그런건 존재하지 않았고, 실용적이지 않단 이유로 나의 페어런트는 사주길 꺼려하셨다. 해서 나는 평범한 스웨터를 입고 그 날을 보내게 되었는데, 아직도 그 서글펐던 마음이 기억이 난다. 그런데 브리짓 존스의 다이어리에서 이 장면을 보았을때 어찌나 단편의 추억이 샘솟던지, 올해는 꼭 화려하게 수 놓인 스웨터를 사기로 결심했었다.
한 사람의 옷차림은 그 사람이 하루 동안 염원하는 감정의 총합이다, 라는 구절 또한 책을 읽고 걸러졌다. 내가 무엇을 입는지, 어떻게 입었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 해도 사실 남보다는 내 자신이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에 이 문장에 공감을 나눈다. 내가 좋아하는, 나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옷을 입고 집 밖을 나섰을 때 느껴지는 그 쾌감이란. 옷은 옷일 뿐이지만-동시에 옷으로부터 얻는 자신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 자신감은 근거 없는 것일까? 이 간극에 대해 오랫동안 고찰해왔지만 사실 답을 아직 찾이 못했다.
단지 몸을 가리고 덥혀주고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천쪼가리 이상인, 사람의 삶을 완성하는 의식주 중의 하나라는 전제로서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고찰할 만한 주제가 되지 않을까. 올 겨울, 따듯하고 부드러운 스웨터를 입고 따듯한 모닥불 앞에 앉아 좋아하는 책을 읽고 싶어졌다. <아무튼, 스웨터>는 그런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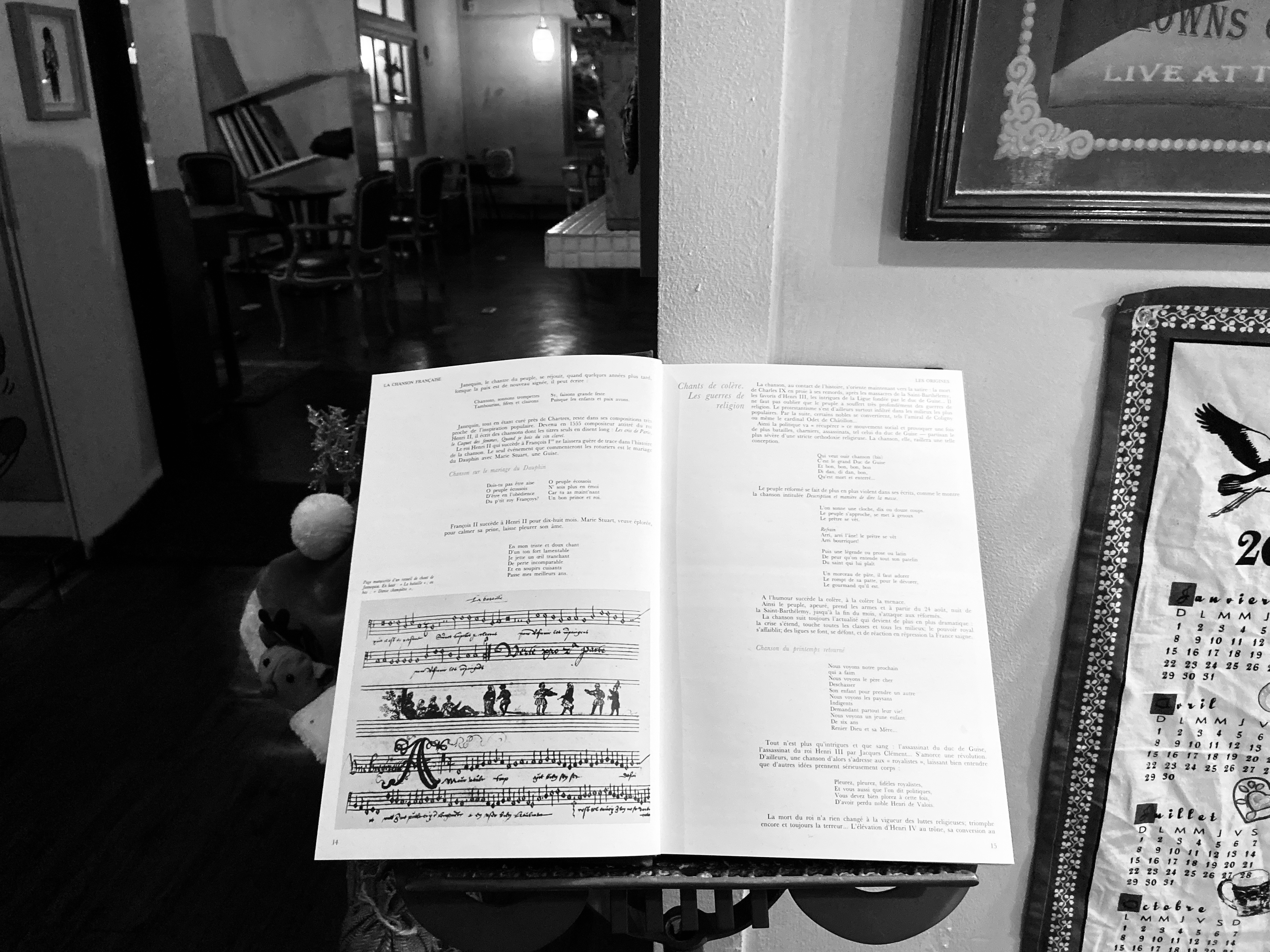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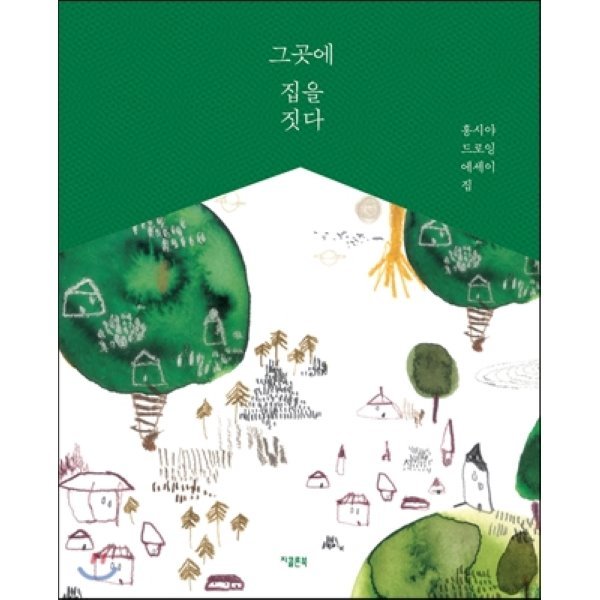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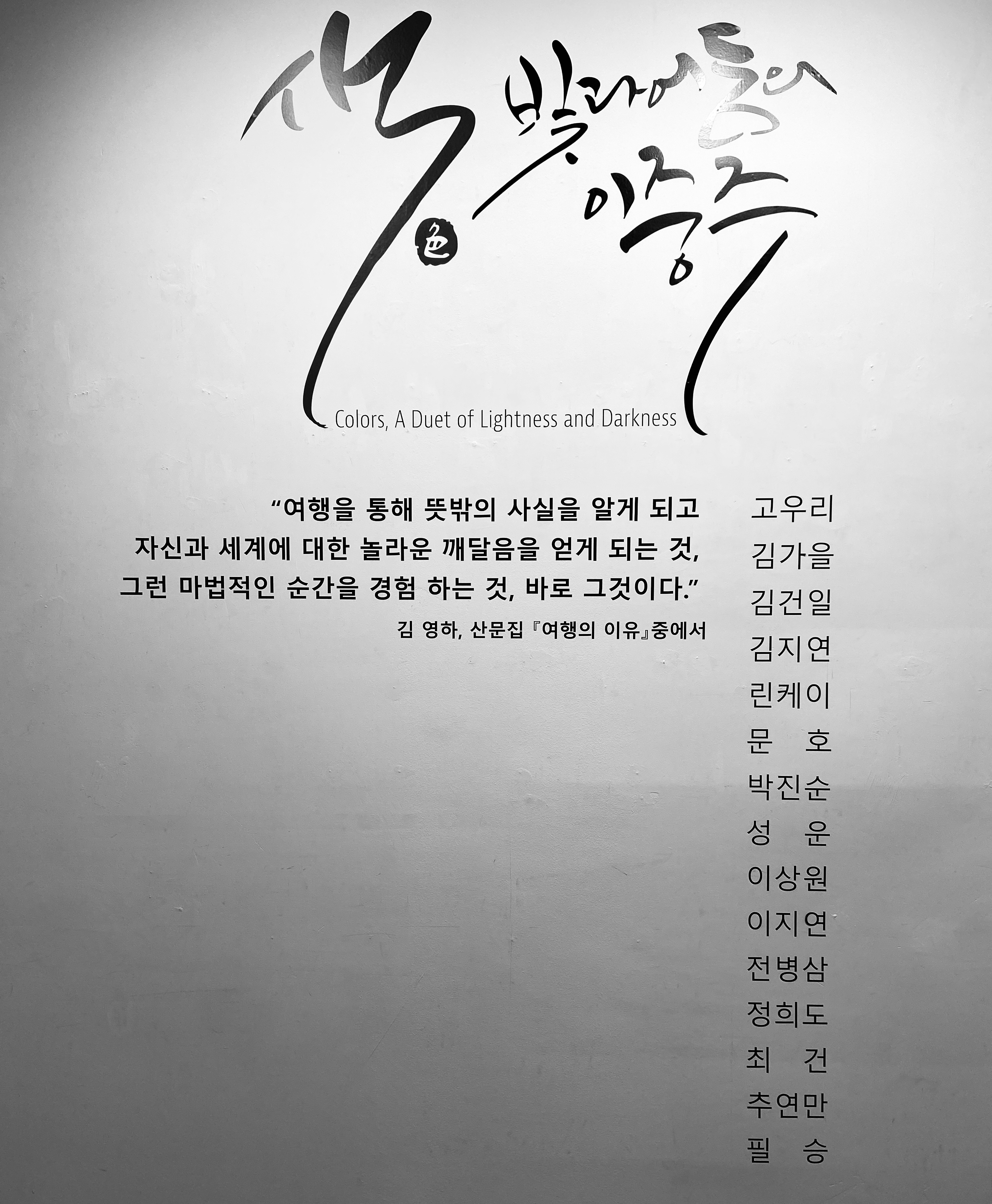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