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생이 온다> '안정성'을 찾아서

90년대생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고 패기롭게 집어든 책. 브런치북 프로젝트에서 은상을 받은 작가님이라고 해서 더욱 눈여겨 보기도 했었는데, 알고보니 포스퀘어 스토리같은 경제 경영서도 쓰신 분이다. 이 책을 읽기전 가장 기대한 '그들과 공존하기 위해 이해하기 어려워도 받아들여야 할 것들'이란 문구에 대한 해답은 마지막 책장을 넘기고 나서 한참 후에야 찾을 수 있었다.
읽기 어려운 책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일과 삶 즉 워라밸(워크-라이프-밸런스)을 중요히 여긴다는 90년대생의 특징은 실제 80,70년대 즉 다른 세대들에겐 찾아볼 수 없는 것이였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흔히 말하는 기성세대와의 간극, 절음이들을 또 다른 사회적 부담으로 여기는 시각 등이 우리(이하 90년대생)들을 불편하게 만든 것이 사실이라면, 반대로 우리가 사회에 진출함으로서 간신히 유지하고 있던, 노년이 보장되지 않는 그들이 내몰린 것 또한 사실이다.
내 주변만 둘러보아도 그렇다. 젊은 직원을 반갑게 뽑고, 그들의 워라밸을 장려하는 정직한 회사는 눈을 씻고 보아도 찾기가 힘든 실정이다. 무료 야근에, 회식에, 온갖 갑질은 아-아-주 당연하다. 어렵게 쌓은 포트폴리오로 겨우 취직한 회사는 그만 둘 순 없으니 다음 회사를 기약하는 방법을 택한다. 어떻게든 1년은 버티자는 심정으로 축나는 몸으로 간신히 다니는 경우가 그렇다. 그렇다면 왜 사회에서 각기 세대가 나란히 벼랑 끝에 내몰려야 하는걸까. 모두가 행복할 순 없을까.
이상적인 사회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미래를 위한 준비, 실험, 모색 등을 충분히 해 낼 여유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안전한 공무원 시험으로 비정상적으로 모두가 몰리고, 대학은 취업학원으로 전략한 이 시대에 내가 너무 많은걸 바라는 것일까? 각자의 능력과 관심사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학습 시간을 누릴 수 있게 하며, 그것을 발전시키며 경제적 활동 또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지반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옳은 사회가 추구해야할 방향성이 아닐까.
이상적인 대략적 그림은 이러하지만 나라고 절대적으로 옳은 사회의 정의를 서술하는 것은 어렵다. 사회적 제도는 누구에게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고 어떻게 주어져야 하는지 공부와 지식이 심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책을 읽을 때면 숫자나 통계치로 정리된 그래프 보다는 공통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모여 논의를 펼치는 장이 절실히 필요해진다. 주고받는 의견 속에서 쌓이는 사회적 경험이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인데, 요새 <서른, 정치를 공부할 시간> 책을 파고 있는 이유 또한 같은 맥락이다.
90년대생의 특징, 새로운 세대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이해하는 방법 등을 서술한 이 책은 아버지 세대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어떠한 '세대'로 묶을 수 있는 특징을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우리 모두에게 권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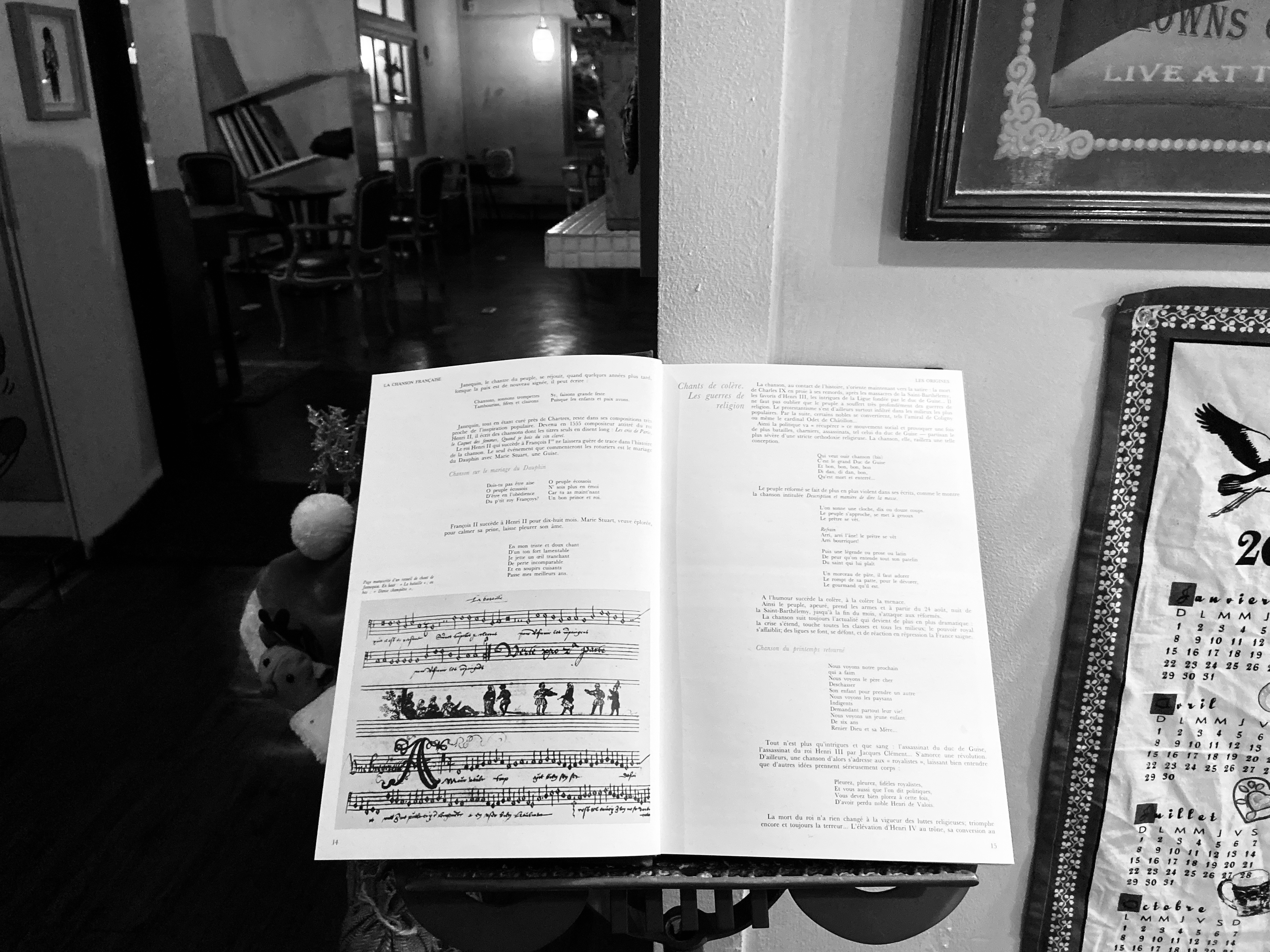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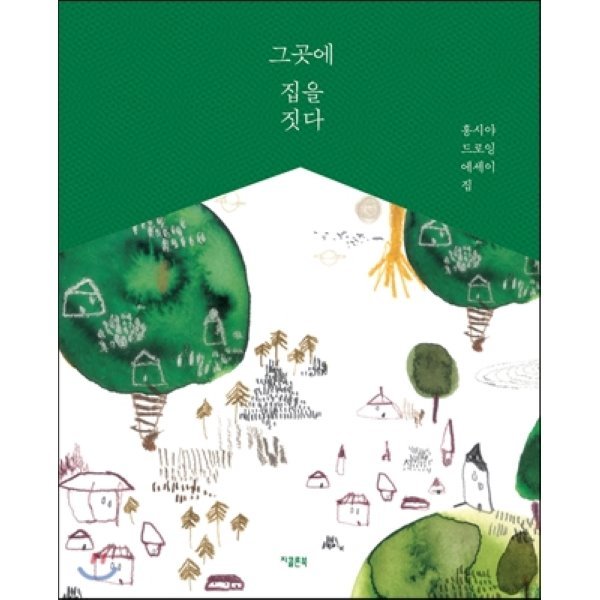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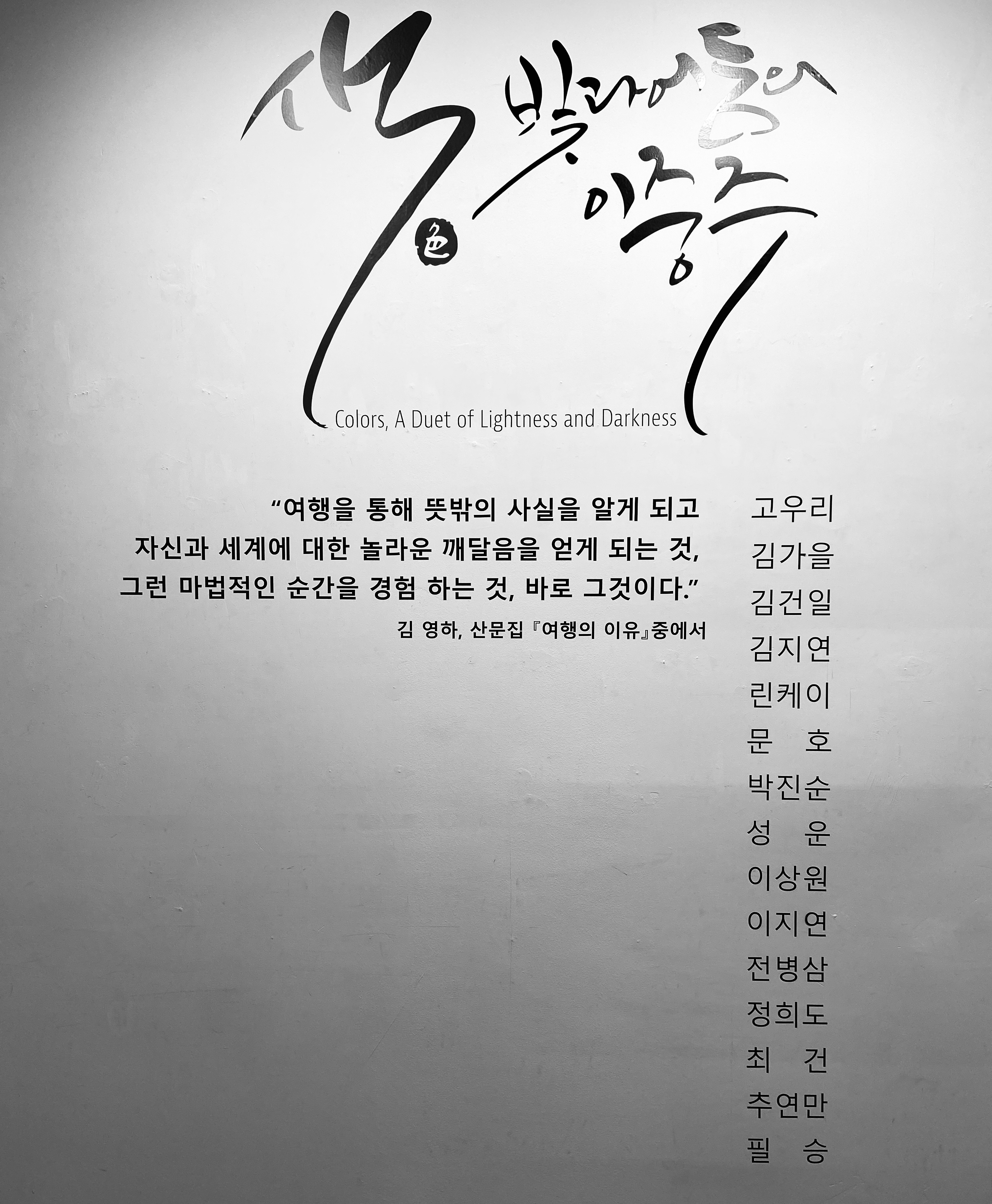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