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과 존엄의 감정사회학' - ⟪ 모멸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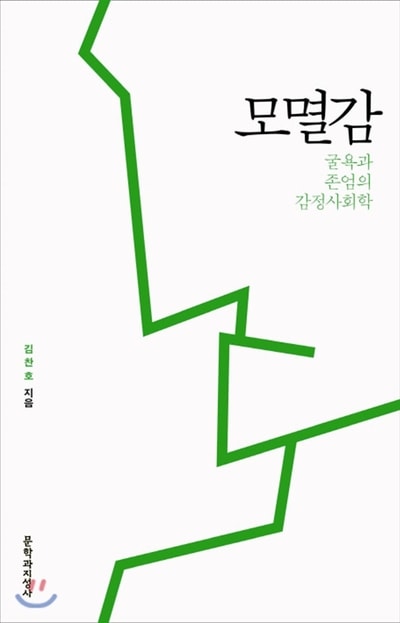.jpg)
김찬호 작가의 모멸감은 대학교 아주 오랫동안 내 서재 리스트에 끼어져 있던 책이다.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수치심, 멸시감 등을 일컫는 감정들에 대해서 적지 않은 고찰을 해왔으나, 책에서도 말하듯이 이성보다 감정이 지배하고 있는 내 마음속은 걸핏하면 객관적인 판단을 하거나 현명한 생각의 굴레를 갖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왔다. 그의 대상은 몇몇 사람들의 가볍고 멸시적인,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겨냥한 태도였다. 그 태도와 상황들, 피치못하게 내 기억속에 각인되어 있는 스쳐지나가듯 발생한 감정들이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 왔기에 이 책은 나에게 필수적인 책이다. 한마디로 본질부터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 고마운 책이라고 볼 수 있다.
'르상티망' ressentiment (원한, 증오, 질투 따위의 감정이 되풀이되어 마음속에 쌓인 상태)가 번식하게 만드는 복잡한 사회구조속에서 작가는 이야기한다. 무엇이 우리가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가. 그 모멸감의 본질은 무엇인가[..]감정은 의식의 수면 아래서 나를 계속 움직인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나는 누구인가. 그 '타자'의 정체를 탐구함으로써 나다운 삶에 한 발자국씩 다가갈 수 있다.
수치심은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수불가결한 감정이라고 설명하며 인간에게 얼굴은 단순한 신체의 일부를 넘어서, 감정과 인품이 드러나는 통로이기도 하다는 말을 비추어 볼때 나는 나의 얼굴을 가장 잘 비추는 거울인 나의 가족을 떠올렸다. 지금 나의 모든것을 결정짓는데 큰 역활을 한 나의 유년시절을 같이 보낸 나의 가족. 그 구성원들의 얼굴속에 깊이 패여있는 주름과 근육 하나하나가 나의 거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자책감과 반성이 동시에 든다고 할 수 있다. 어렸던 시절에 나도 모르게 가장 많이 상처를 주었던 것은 낯선 타인이 아니라, 어쩌면 나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낸 가족이 아닐까. 배려하지 못하고 뱉은 말들, 표정, 태도 그 여러 것들로 인해서 몇몇 상황속의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아파하고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다.
흥미롭게도 감정심리학의 연구에 따르면, 누군가를 경멸할 때는 심장박동이나 혈압 또는 뇌의 신경전달물질 등 생리적인 반응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는 데 별로 힘이 들지 않는다는 말이다. 무시하는 표정이나 비웃는 눈빛, 퉁명스런 말투로도 간단하게 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크고 작은 모멸감을 불러 일으키며 살아가지 않는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도 의도하지 않은 새에, 상대방의 깊은 슬픔을 배제하고 가벼이 넘겨짚으며 두번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주 사소한 배려로부터 출발하는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늘 검열하고 조심해야할 부분이여야 할 듯 하다. 물론 쉽지는 않다. 늘 나를 배려하고 생각해주는 여유와 타이밍을 가진 상대방을 만나기란 어려울 것이고, 나또한 그렇다. 하지만 그렇기에 나부터 영혼을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
인간 개인의 내면 그리고 사회에는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어두운 심연이 있다. 매일 접하는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규모와 강도에서 차이가 있을 뿐 이유 없는 저주와 맹목적인 폭행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많은 경우 그 씨앗은 모멸감으로 밝혀진다.
말도 안되는 일들이 매일 일어나는 현재. 그 누구도 타인을 멸시할, 굴욕을 줄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내가 소중하듯 우리 모두가 똑같이 소중한 것이다. 이 당연한 일을 간과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그 사람들의 이기적인 몸짓과 시선과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 그 누구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헛된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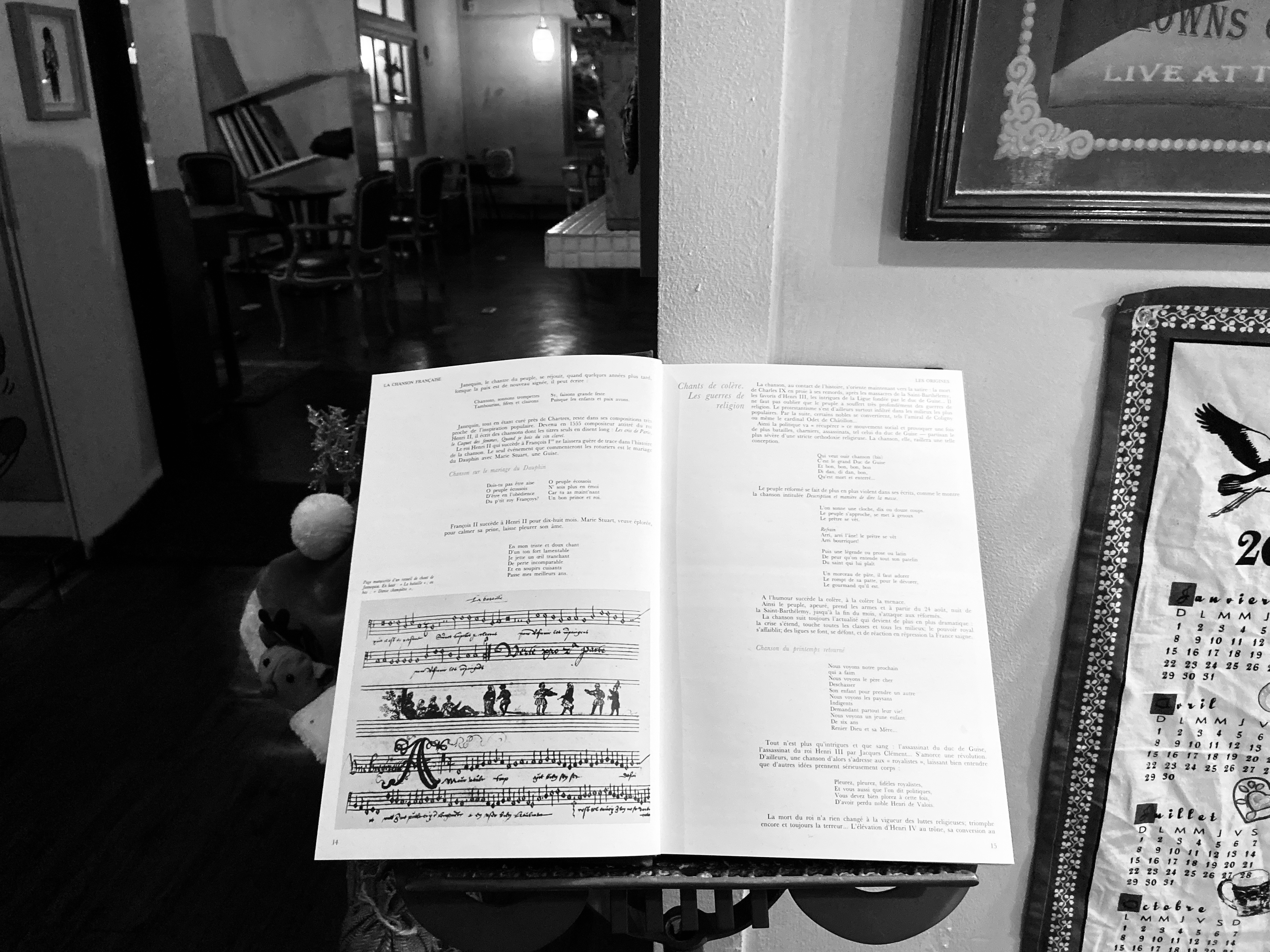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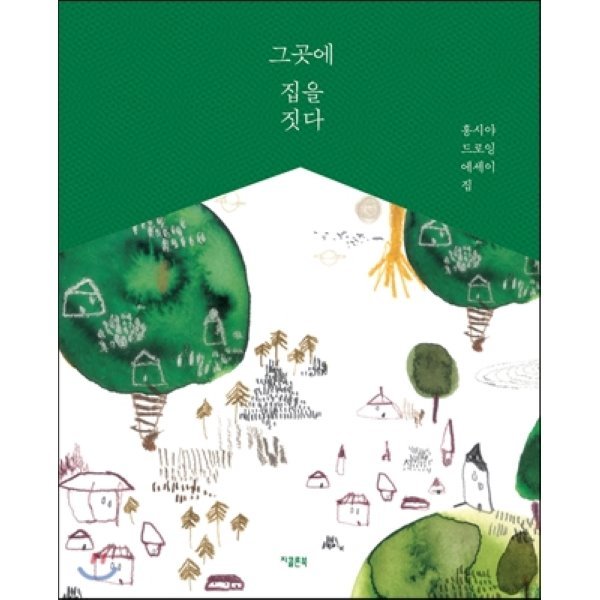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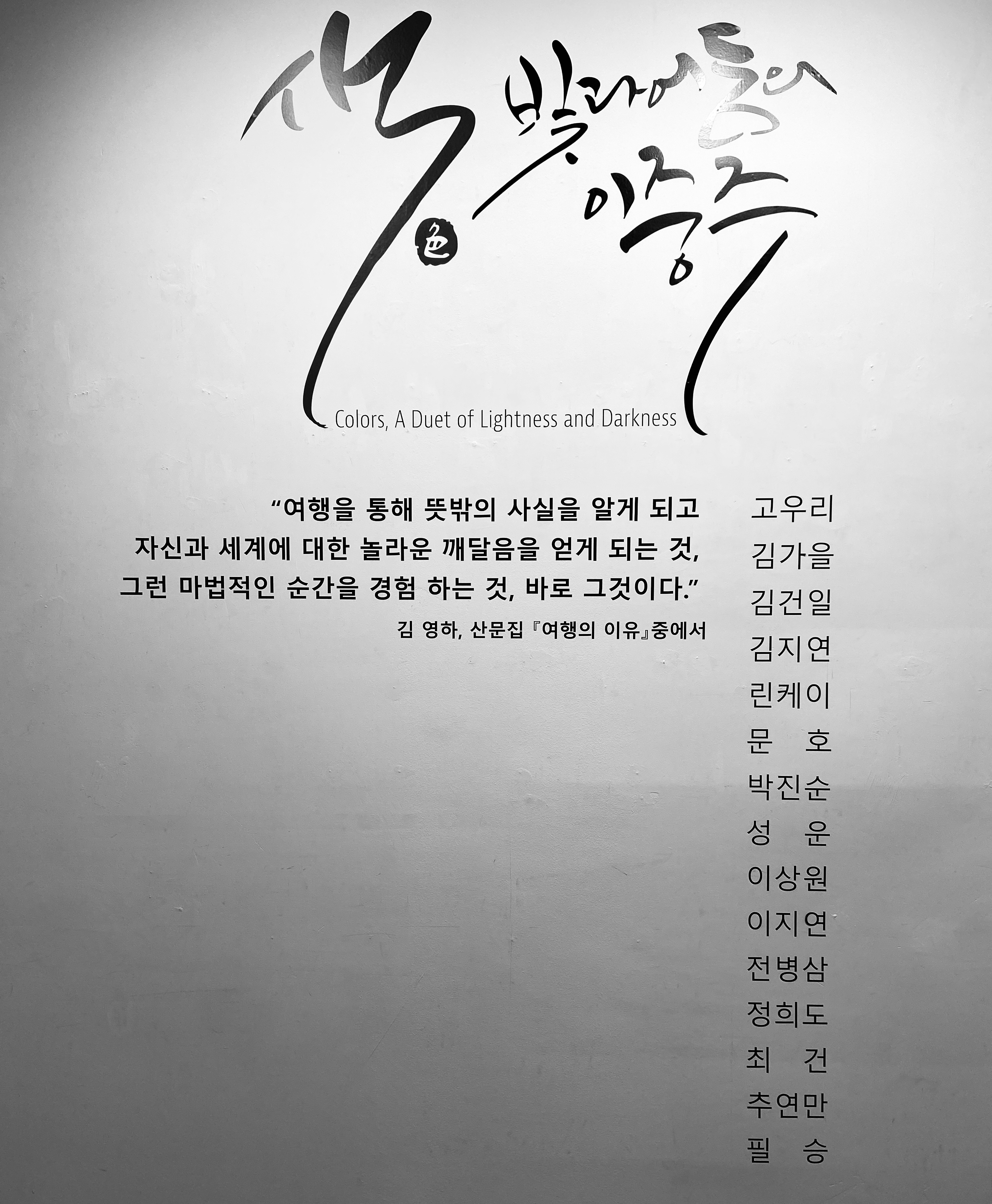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