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도 빛과 그늘의 역사가 있다' <대한민국 넷페미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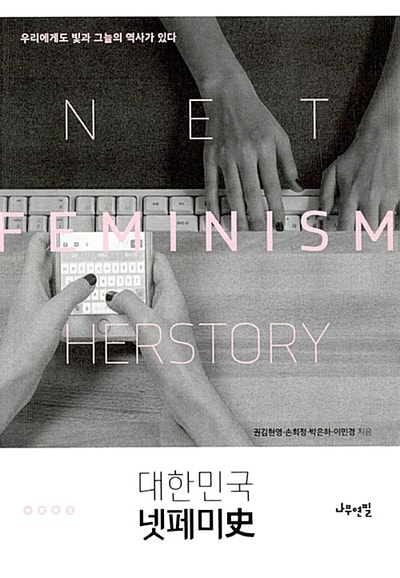.jpg)
넷페미의 역사
"2015년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페미니스트들은 소비 자본주의와 대중문화의 수혜 속에서 자란, 그래서 소비자 정체성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이들이다. ‘pg 114[페미니즘 리부트] 문화과학 83호, 2015년 가을’" 내 자신을 이 자본주의의 물결 속에서 흽쓸리지 않고 오롯하게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다는 상상을 그리고 그 실현을 깨우기가 어렵다는 것은 진작 느끼고 있었기에 그 고통은 이. 한 문장으로 결속되었다.
“현재, 온라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그것 자체가 이미 삶의 일부인 세계로 돌입한 거에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삶을 구분하면서 온라인의 정체성은 거짓이다? 오프라인의 삶이야 진정한 것이다? 라고 구분할 수 없는 것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형국이라는 말에 백번 동의하고, 계속해서 느끼는 회의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 ‘가수’로서 어디까지가 아티스트이고 어디까지가 딴따라인n 가. 대학을 나오고, 밴드 활동을 하고, 내 이름의 앨범을 내고, 나를 얼마나 더 ‘소비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설득력있게 쌓을것인가는 그 바탕에 자본주의가 속해있지 않을 수 없다.
내 커리어인데 뭘 하든 내맘이지, 돈 잘 벌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철면피를 끼우기엔 너무나 얕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불가능한 시점. 하지만 무엇이 행복한 것일까. 10유로를 벌며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는 삶이 행복한 것일까, 뉴욕의 유명한 재즈바에서 이름을 날리고 온갖 행사에 불려다니며 인기를 떨치는 소위 ‘잘나가는 보컬’의 삶이 행복한 것일까. 내 정체성과 음악은 얼마나 분리가능한 것인가. 노래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꼭 묻고 싶은 말이였다. ‘왜 노래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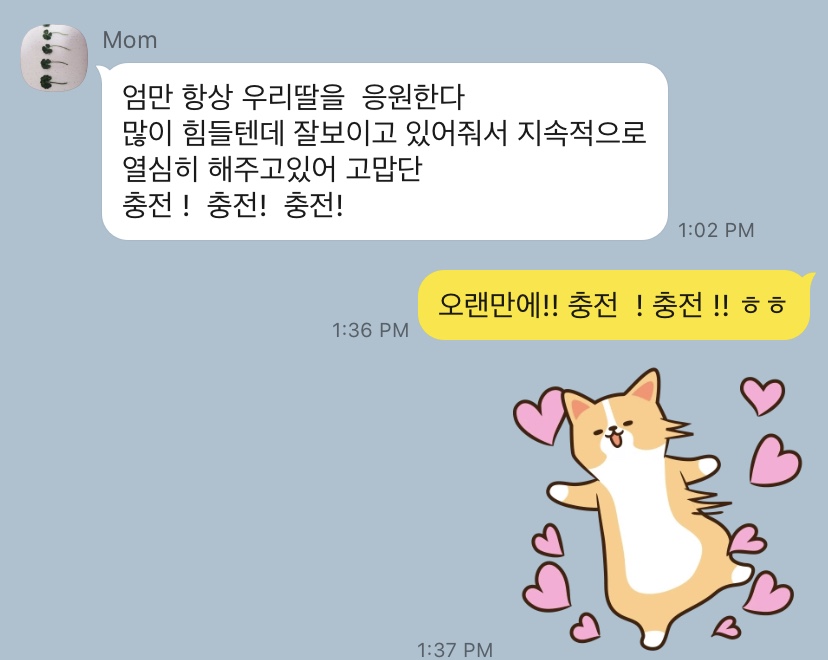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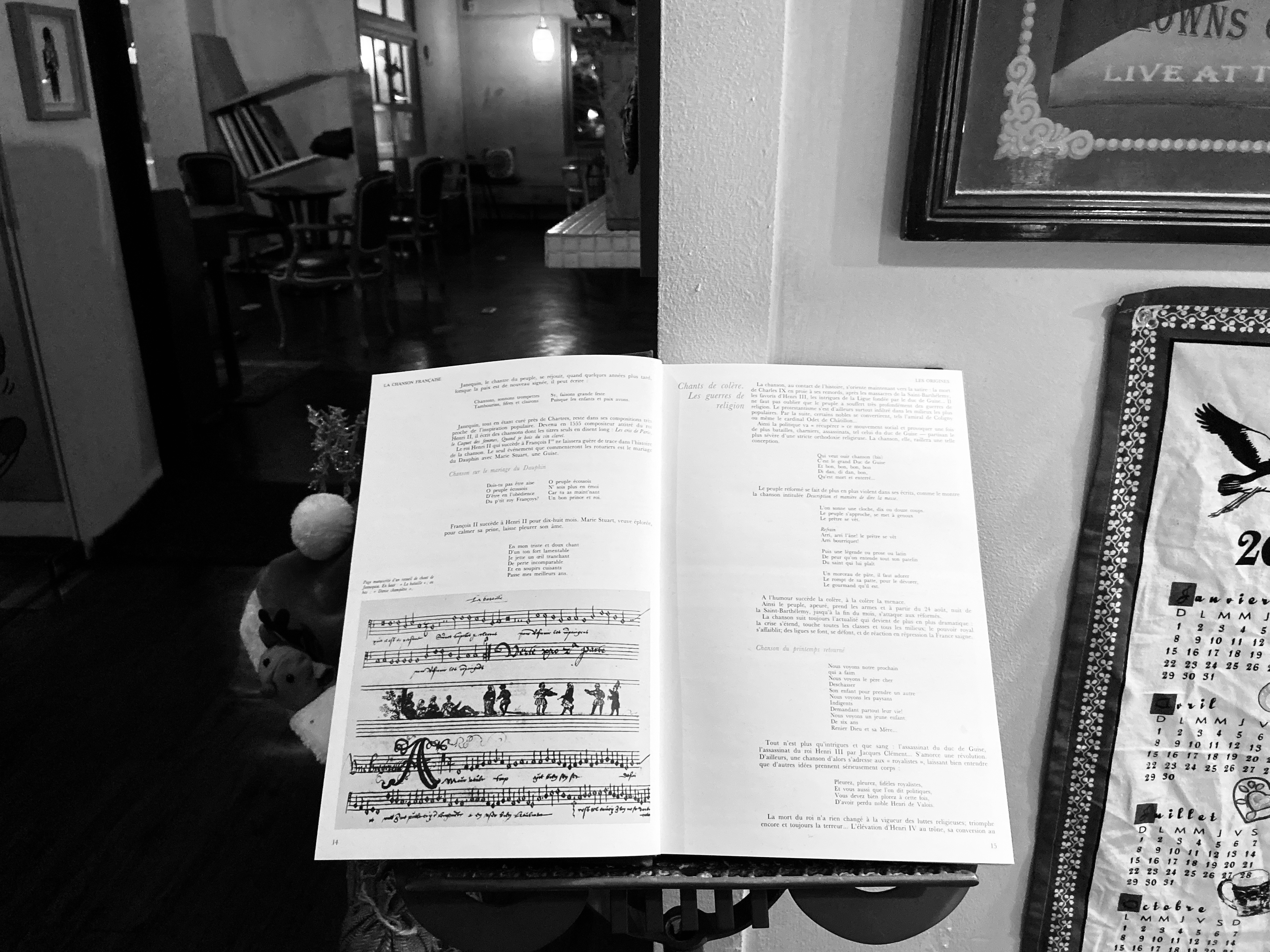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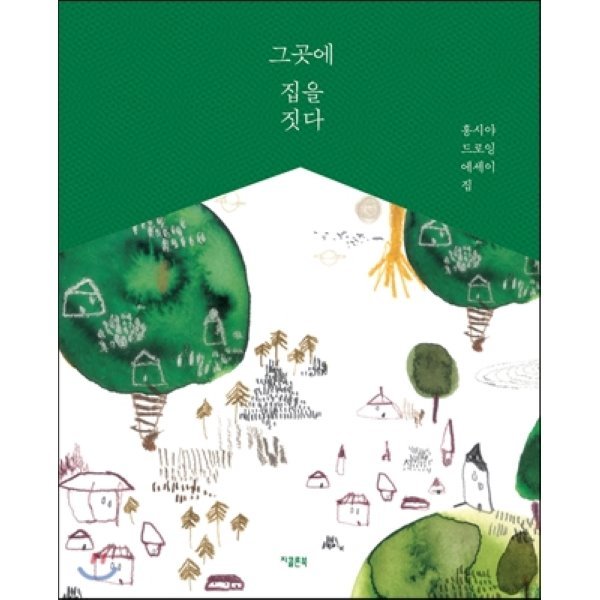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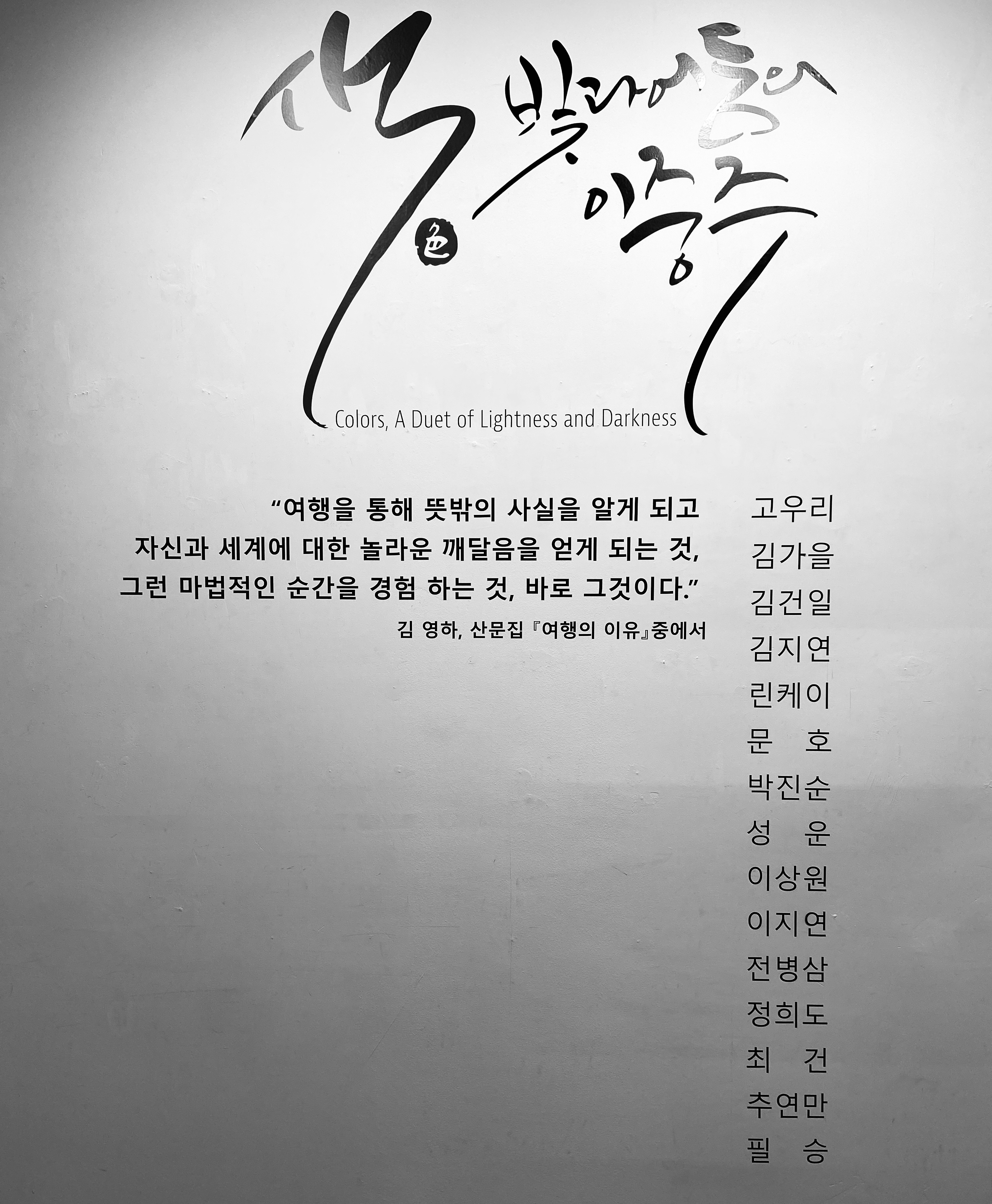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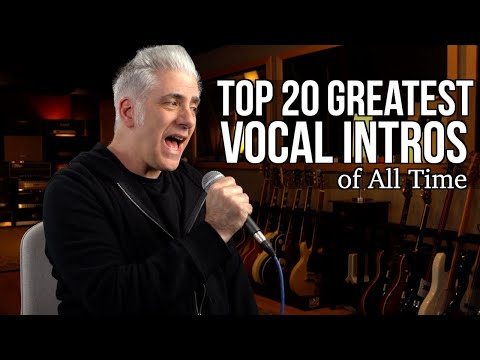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