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필요했던 애도작업, <좋은 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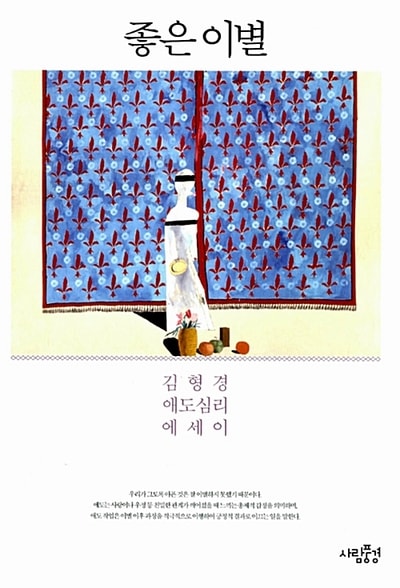
우리에게 이별문화란
사랑을 시작하는 과정은 우당탕탕 굴러 만들어질 수 있거나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는데, 이별은 어떠한가 생각해 보게끔 해준 책이다. 나의 이별, 즉 애도 능력은 어떠했나. 이별할 때면 분노하거나 절망하는 행위밖에 할 줄 몰랐던 친구들에게 (또한 나를 포함) 항상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 사랑이 끝나면 쿨하게 친구로 전환하거나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외국영화의 케이스를 볼 때 이 책을 써야겠다 생각했다는 작가 김형경님의 한마디는 이것이다. 이별은 성장과 변화의 기회이다. <사랑을 선책하는 특별한 기준>, <사람 풍경>, <성에>, <천개의 공감>, <꽃피는 고래> 등을 펴내며 작가의 상실과 애도에 대하여, 인간 마음을 개괄적으로 이해하고 파고드는 길에 대하여 등 다양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감사한 작가이다.
그녀가 읽어왔던 책과 건네 받았던 타인으로부터의 위로, 그리고 연구를 통하여 이 책에 담은 내용에 나는 적지않은 치유됨을 느꼈다. 내가 겪었던 불완전한 애도의 방식은 결국 나를 갉아먹는 것이었음을 깨달았기에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던 슬픔, 분노, 미련 등은 그곳에 있을만 했구나, 싶었다. 건강한 이별문화가 나에게 정착될 때까지, 무던히 노력하자. 사랑만큼이나 나를 자주 찾아오는 이별과 잘 마주하고 손써보는 것이다. 이 책 덕분에, 이제야 그럴 힘이 생겼다.
밑줄 친 한마디
페터 한트케가 통찰한 것처럼 주검 곁을 지키도록 하는 관습은 인류의 그리움이 모여 만들어 낸 애도 의례일 것이다.
그리움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상실한 대상에게 사로잡힌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어느 지점에 이르면 그리움은 과거와의 싸움으로 변한다. 우리는 기어이 상실의 공간, 죽음의 장소에 갇히고 만다.
그리움과 함께 살아가기. 떠난 사람을 찾아다닐 게 아니라 내면에 이는 그리움의 감정을 잘 지켜본다. 힘들겠지만, 그리운 감정을 내면에 간직한 채 일과를 꾸려 간다. 그리움과 함께 밥 먹고, 그리움 곁에 누워 잠들고, 그리움을 업고 산책한다.
아름다움이 언제나 유한성을 전제로 하듯이, 상실한 것은 늘 더 미화되고 이상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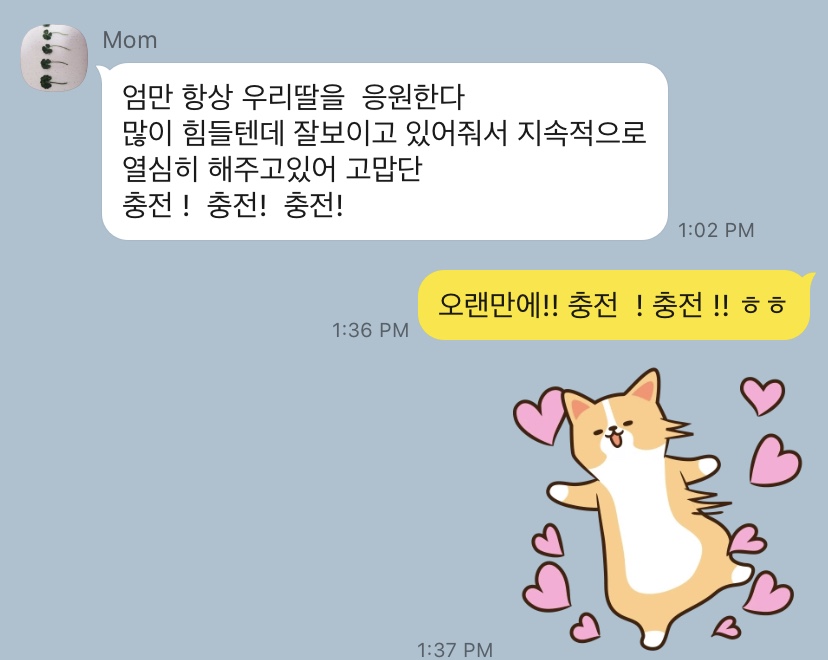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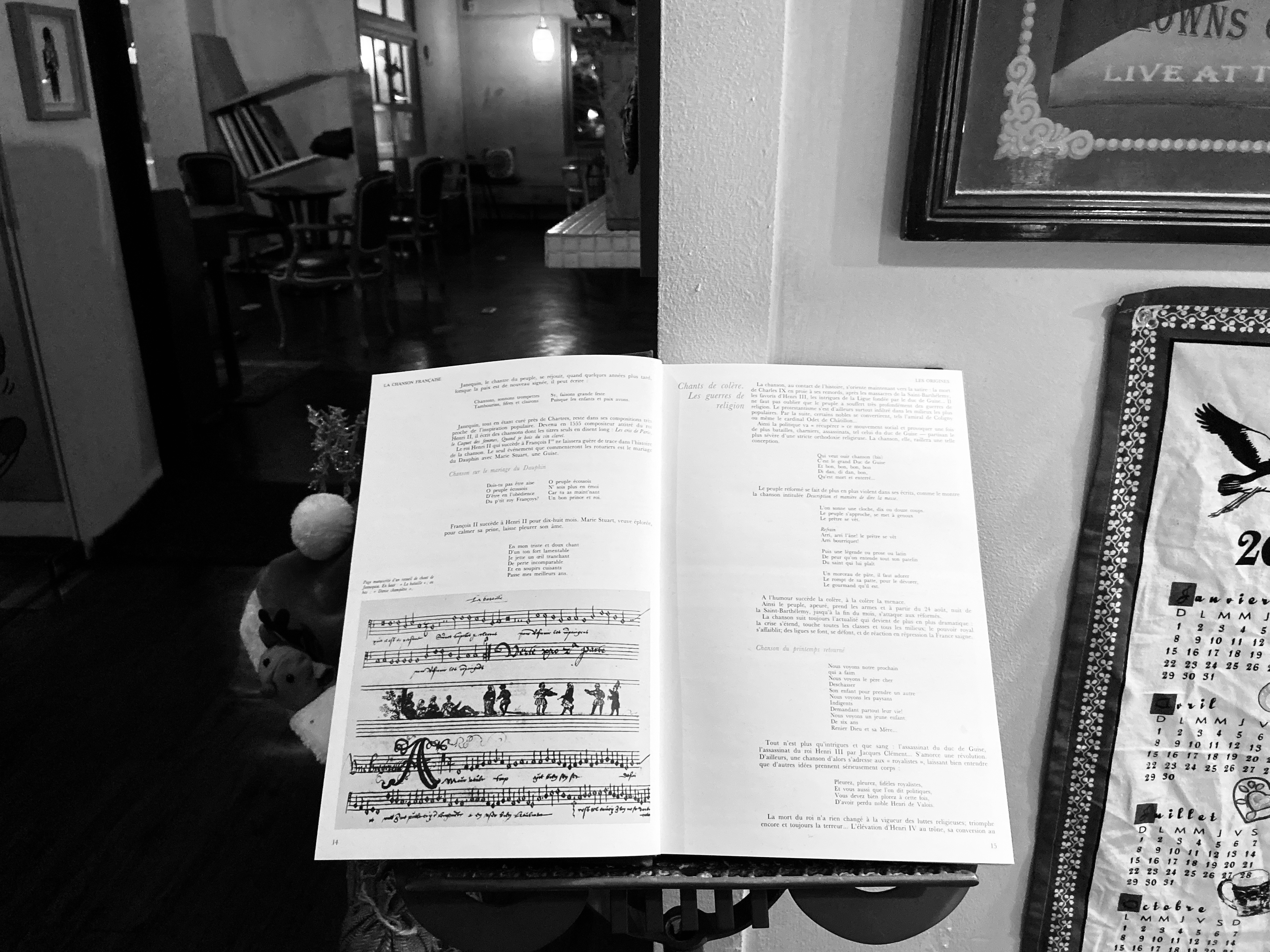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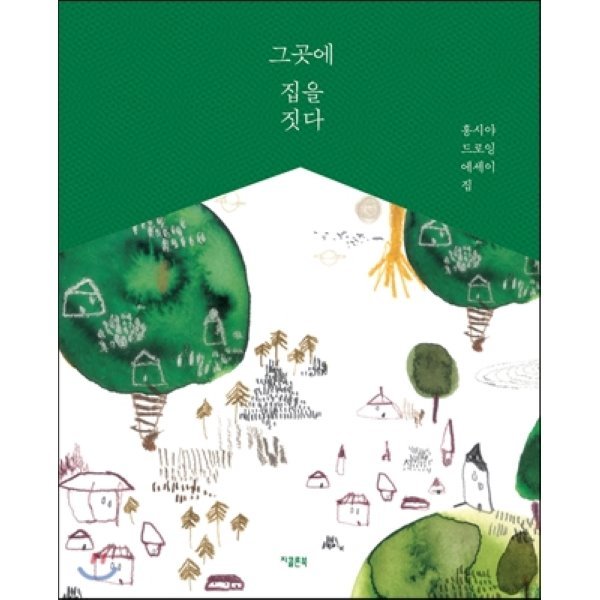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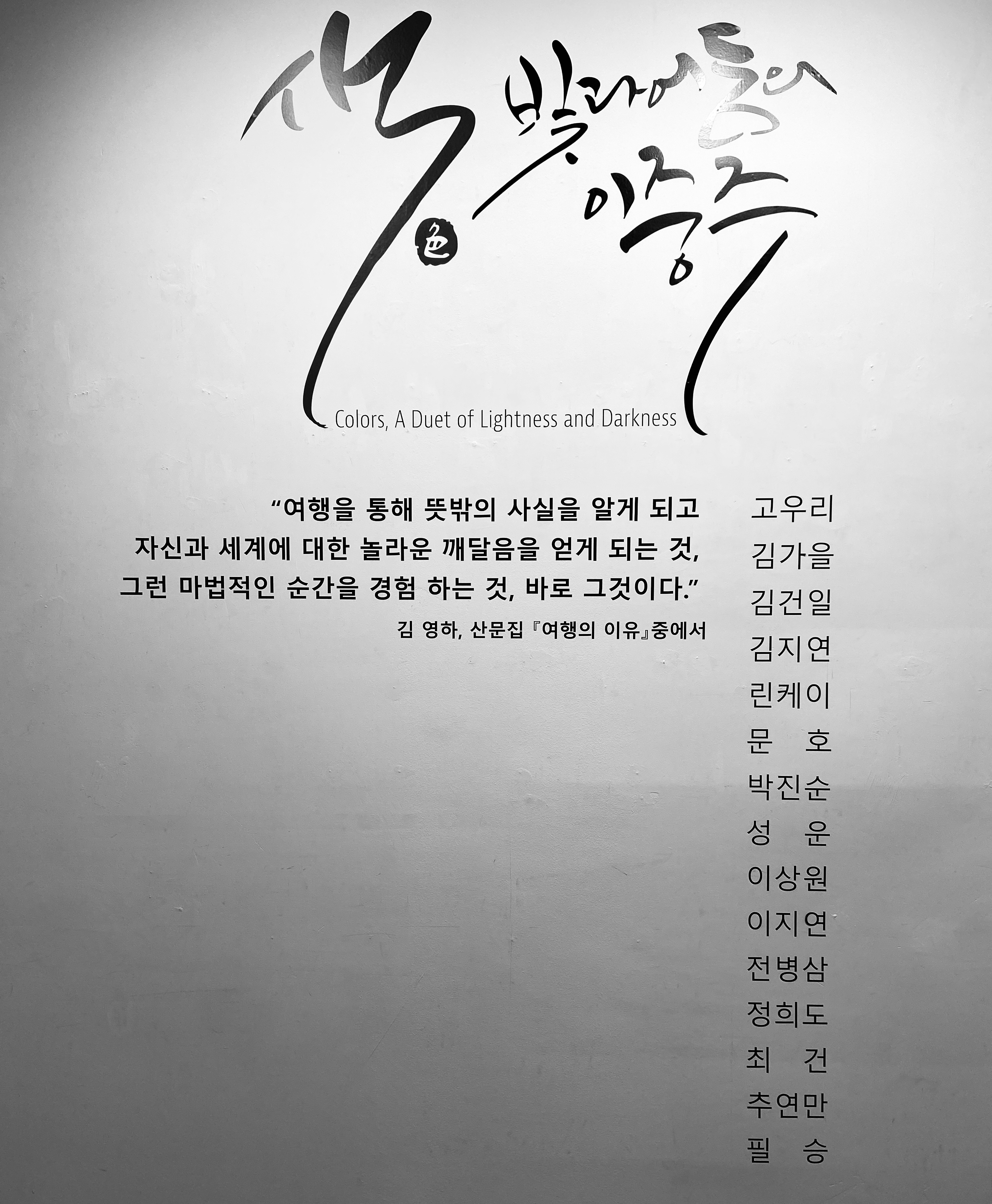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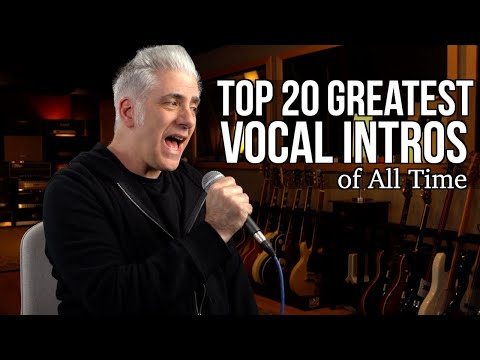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