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을 견디는 것과 외로움을 견디는 일, 어떤 것이 더 난해한가 <나는 잠깐 설웁다>

허은실 시인의 '목 없는 나날' 중의 글귀. 과연 어떤 쪽의 버팀이 더욱 난해할까. 해결될 수 없는 딜레마라고 말하는 사람도 존재하고 타인을 선택하며 되풀이 되는 후회를 일 삼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나는 주로 외로움을 견디는 쪽인데 그러다가 종종 훅 치고 들어오는 연기 같은 인연 들도 가볍게 맞닥뜨리곤 했다. 그러다가 그 연기가 서서히 사그러 들면 다시 외로움인 일상으로 걸어 돌아왔다. 굳이 저 질문에 나의 대답을 내놓는다면 이렇게 말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늘상 흔들리는 내 자신을 견디는 것이 더욱 난해하다고 느끼는 걸? 타인과 외로움은 나중 문제다.
사람에게 지칠수록 내 마음을 다독이며 가다듬곤 한다. 내가 좋아하는 행위들로 잠시나마 고요한 시간을 채우고 좋은 음악과 좋은 책으로 영혼을 충전한다.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 이제 괜찮아졌다 싶으면 다시금 핸드폰을 들여다 보는데 항시 밀려있는 메세지들과 이메일이 답장을 재촉하고 있다.
정신 없이 일을 처리하다 보면 또 한번 마음이 붕 떠서 가라앉히는데 한참이 걸리기도 하고, 주위를 둘러 봐도 다들 나 같이 나약한 사람들 뿐이라 투정하는 일도 사실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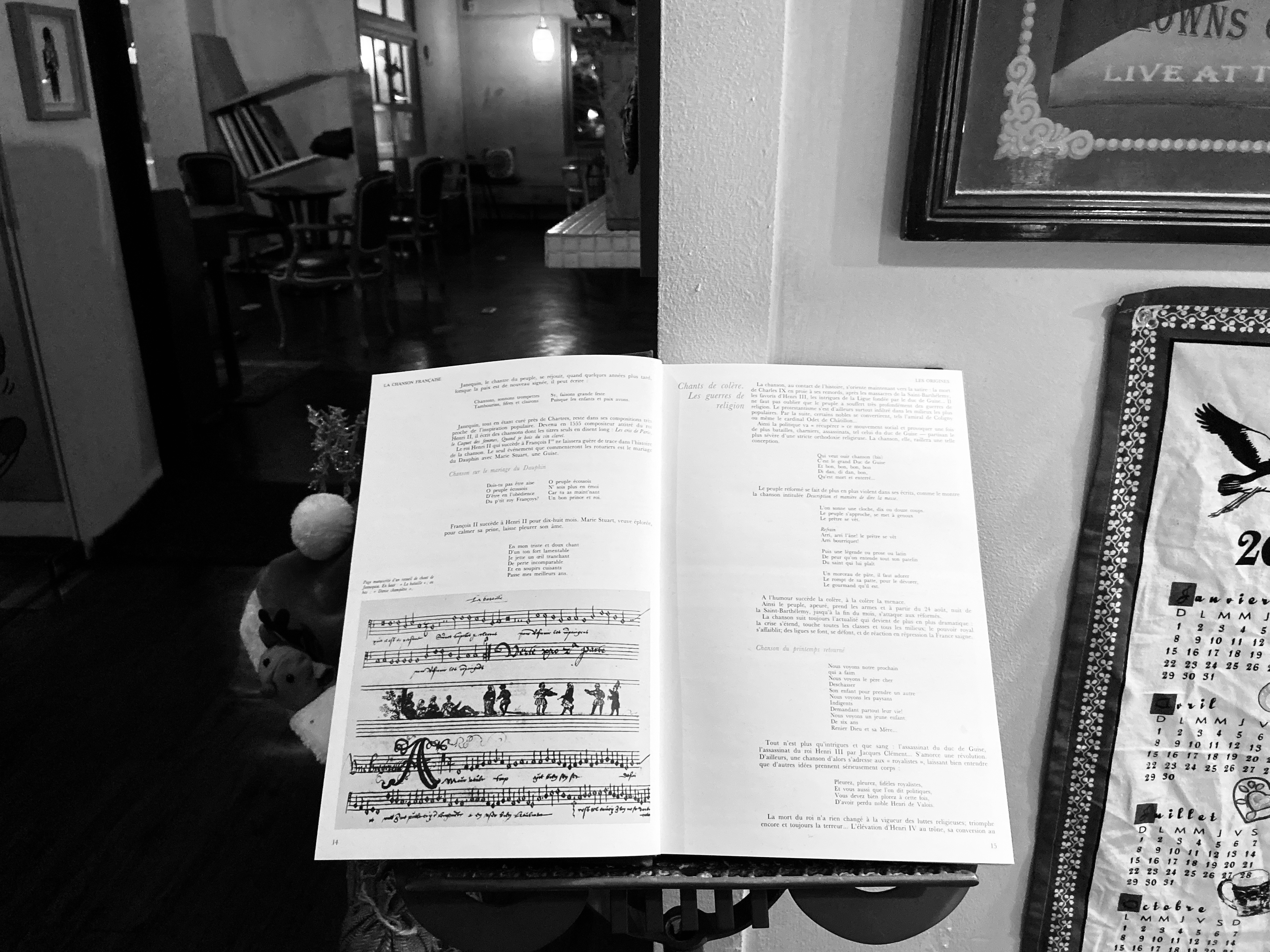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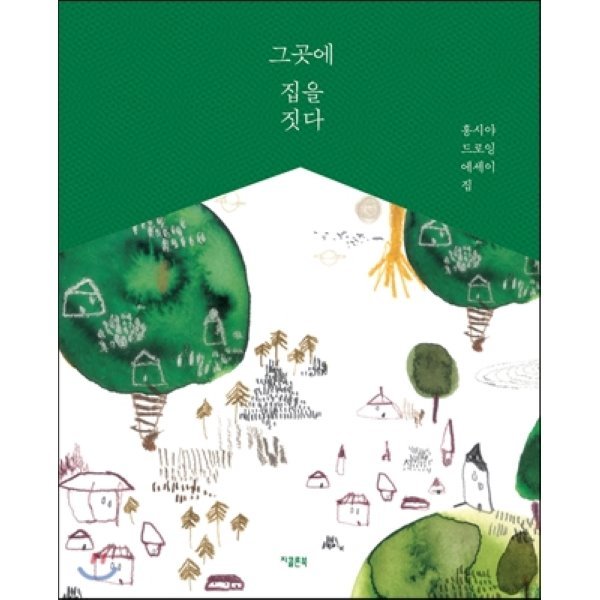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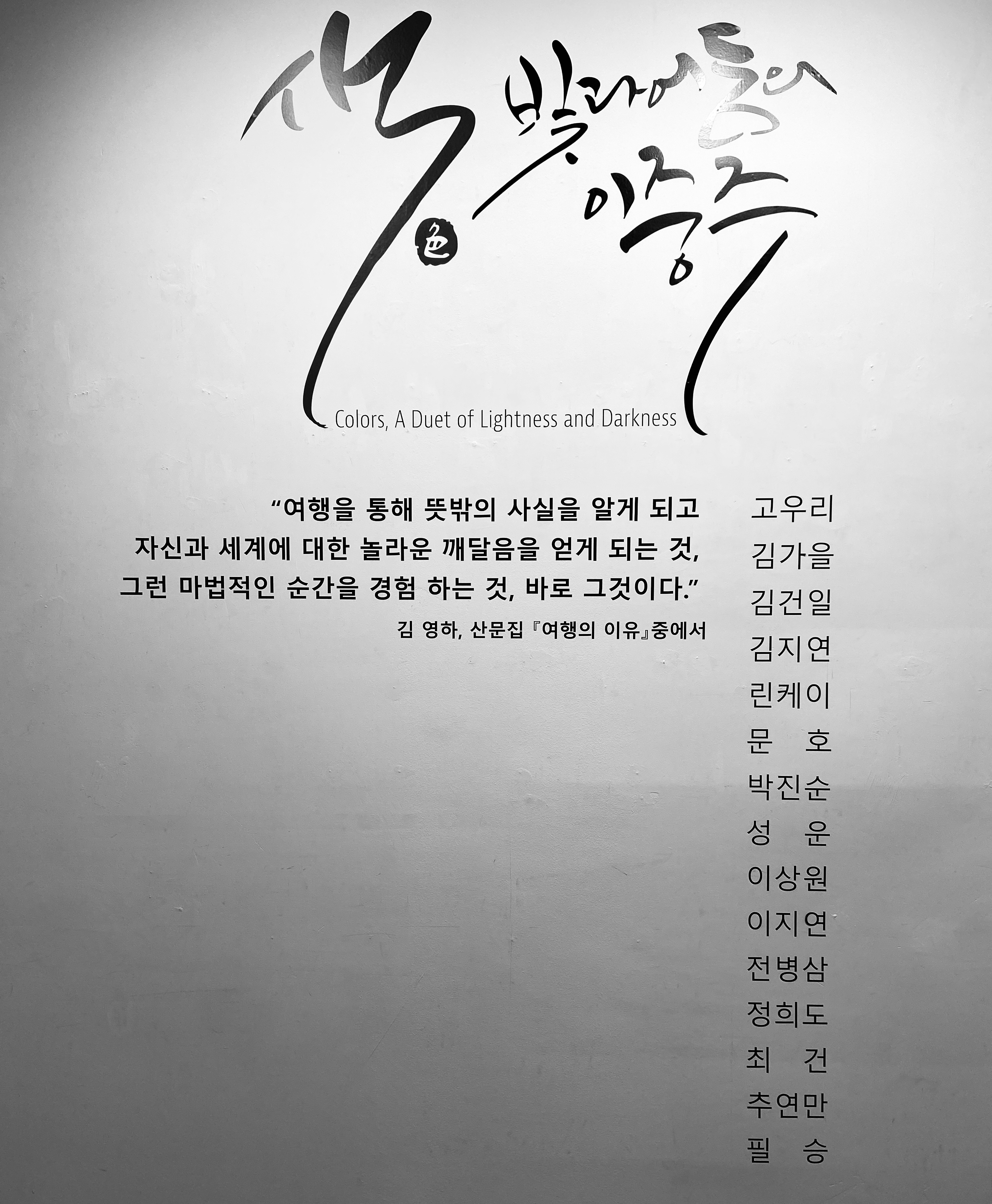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