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에세이] 집중의 순간

카페의 백색소음, 즉 화이트노이즈가 내게 도움이 될때가 있지만 또한 그렇지 않을때도 있다. 똑같은 장소에 속해있더라도 그 상황을 만드는 그날의 기분, 주변 사람들, 컨디션 등이 그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자주 들리는 카페로는 땅다방, 헝부또 가의 Terres de cafe. 그날 읽을 거리를 정해가진 않지만 지하철에서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고, 도착해 앉자마자 독서를 시작하는 편이다. 하지만 그 집중도의 깊이란 때마다 달라지기에, 그 간극에 대하여 고찰해보았다.
보통은 주위 사람들의 대화소리, 커피콩을 분쇄하는 기계의 소음 등이 나와 글자 사이 훼방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 꺼낼 이야기는 며칠 전의 일화다. 운동이 끝난 후 녹초가 된 상태로 굉장히 배가 고팠다. 카페로 간신히 걸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마신 커피의 한모금은 이 후 읽는 책 속으로 들어가는 나의 집중도에 굉장한 영향을 주었다. 카페인의 힘일까. 어찌됐든 그 한 모금이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책에 집중하는 것 외의 내 모든 세포를 무디게 만든것이다. 어떤 힘인지 모르지만, 늘 이러한 경험은 예상하지 않은 경계에서 일어난다. 그날 자리에서 완독한 책은 세번째로 읽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는 책>.
하지만 이틀 뒤, 다시 찾은 땅다방의 그 똑같은 그 자리에서의 경험은 180도 달랐다. 이상하게도 주변 소음과 미세한 움직임에도 새롭게 반응하는 내 귀와 몸 때문에 도저히 글에 집중 할 수 없었다. 가방을 올려둔 자리도 똑같고, 심지어 에스프레소는 이틀 전 보다 더욱 향과 맛이 좋았는데 불구하고 말이다. 뒷자리에 앉은 사람의 소란스런 웃음소리, 직원이 내려놓는 커피잔이 부딫히는 소리 등이 날카롭게 신경세포를 자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내 빈약한 의지는 결국 이십여분만에 무너지고 말았다. 같은 곳을 몇번이나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 읽기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단순히 내가 머리가 나쁜 것일수도 있다는 짐작은 건너뛰자)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어 결국 카페를 빠져나온 후 가랑비에 젖은 길을 솔솔히 걸었다. 내가 걷기에 집중하는 만큼의 정도 이상으로 필요한 무언가의 힘, 그 힘을 빨아들이는 글자, 책. 마법같았던 지난 날의 집중도는 쉽게 찾아오지 않기에 오늘의 실패는 더욱 아쉬웠다. 늘 성공할 수는 없는 일일테지만 그나마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곳으로는 사람이 북적대는 마레의 카페보다는 고요한 공원이 있다. 이 날의 실패를 딛고 다시금 카페에 도전하겠지만 그래도 역시 새소리와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살랑대는 소리가 가득한 공원이 짱이다. 얼른 가서 독서력을 충전해야지.
모든 것은 이미 책 속에 다 있다. -레진 드탕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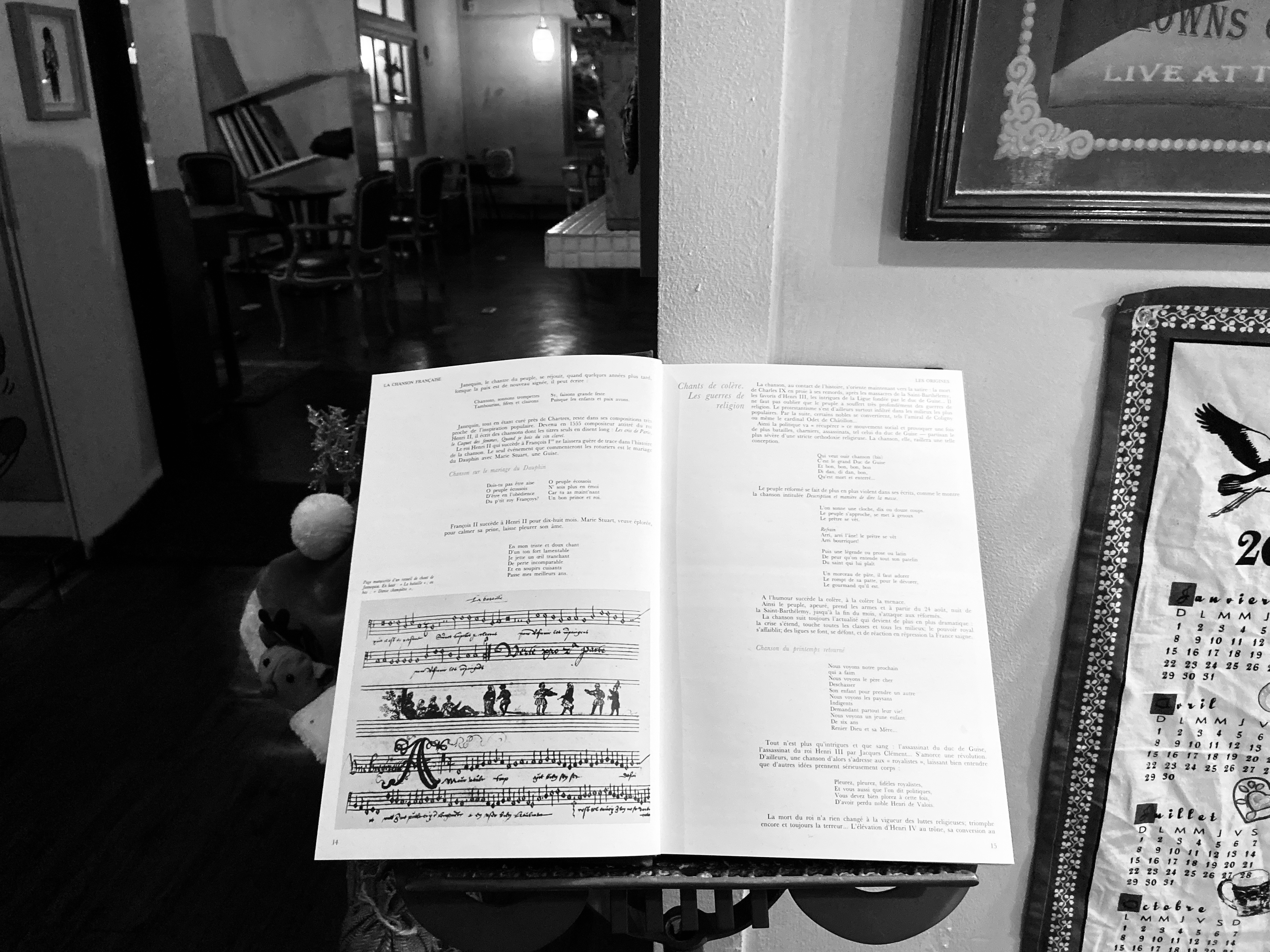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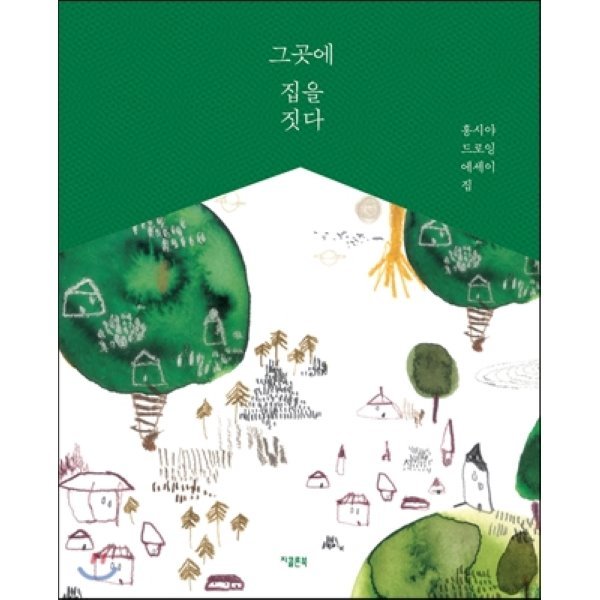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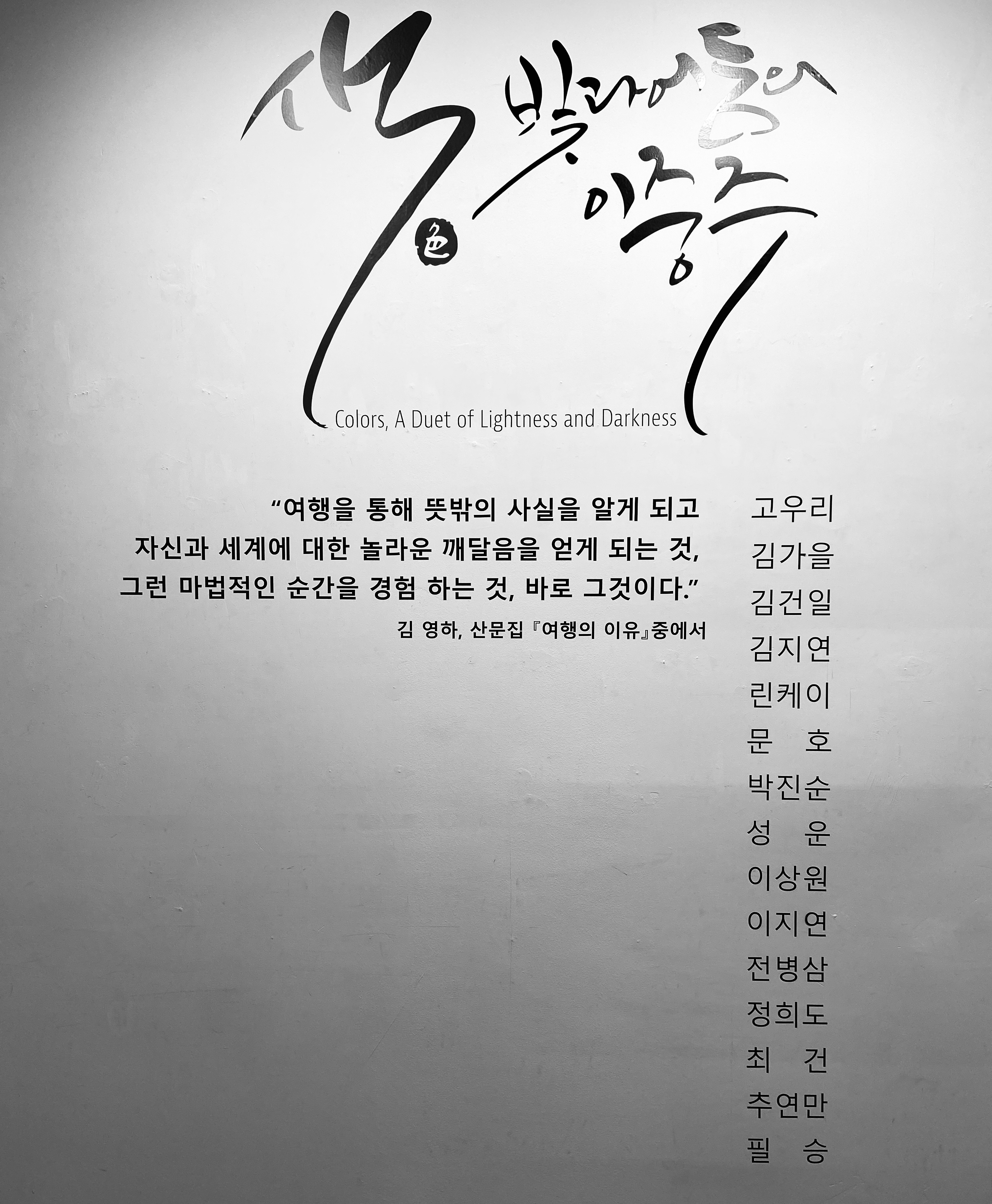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