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세이] 텅 빈 벽을 채우는 일

언젠가부터 집 안을 꾸미는 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인테리어 라기 보단, 하얀 벽을 채우는 것에 더 가깝겠다. 약간 꺼진 소파에 앉아 가만히 벽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기에 그 하얗고 텅 빈 벽에 무언갈 채워야겠다는 생각이 어느날 강하게 들었다. 이왕 편안하게 쉬어야 하는 목적이 깃들어 있는 공간이라면 그 곳을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야 하지 않겠나 해서 처음엔 한국에서 가져왔던 사진 (거의 나와 가족의 어렸을적 사진) 을 한 구석에 조그맣게 붙였다. 그러자 휑하고 어두웠던 방이 갑자기 밝아졌다. 크고 공허했던 벽이 돌연 작고 따듯한 기운을 내뿜기 시작했다. 집이 돌연 다른 어느곳 보다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난 후, 내게 뜻밖의 선물이 도착했다. 무려 매그넘 파리의 사진집이였다. 앉아서 그 벅찬 선물을 열어보며 한장 한장 넘기며 감탄을 내뿜었다. 사진의 향의 흠뻑 취해버린 후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간신히 팔을 들어 SNS에 생존신고를 했을 뿐. 난 무언가에 한번 빠지면 굉장히 깊게 파고드는 경향이 있는데, 딱 이 경우가 그러했다. 사진과 카메라. 이 두가지에 빠져버렸다. 한손엔 가위를, 한 손엔 테이프를 들고 미친듯이 사진을 잘라 벽에다 붙이기 시작했다. 그냥 하루종일 가만히 보고만 있고 싶은, 내게 진한 감동을 줬던 사진들 위주였다. 세어보니 총 42장이였다.
각기 크기도 색깔도 구도도 포커스도 다른 테마의 사진들이 벽을 가득 메웠다. 순간,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가득 지켜봐주는 느낌이 들어 이제 외롭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뭐라고 난 채워진 느낌이 드는 걸까? 고작 텅 비었던 벽위에 사진들을 덕지덕지 붙인 것 때문에? 글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내 방에 가득 떠다니던 먼지들과 널부러져 있는 책이 이제는 이렇게 말해주는 듯 했다. 와, 전과는 완전 딴판인 공간이 되버렸네. 난 혼잣말로 대답했다. 그렇지? 손에는 가위를 들고 춤을 추며 아무도 날 지켜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자유를 느꼈다. 이제 온전한 내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 이후로 이 공간에서의 시간은 완전히 달라졌다. 한국을 잠깐 다녀와서 친구들과 찍었던 인생 네컷 사진이라던지, 좋아했던 전시장의 포스터라던지, 와인바에서 얻어온 버킷리스트 종이 같은 것들도 벽에 올라갔다.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전부 벽에 박제한 셈이 되버린 것이다. 뭐, 나의 공간인데 누가 뭐라하리? 이제 더 이상 무미건조한 시멘트벽이 아니라 내 인생을 채우고 있는 빛나는 것들의 모음집 게시판이랄까. 난 이것들이 내 집에 존재한단 사실만으로 마음 한켠이 든든해졌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요새는 그런 생각을 한다. 일을 크게 벌리는 경향이 있는지라, 아예 사진집이나 편지 말고도 좋아하는 앨범커버나 영화 포스터로 도배를 해볼까 라는... 물론 집이 엄청 커서 붙일데가 많다는 뜻은 아니다. 그냥 내 욕심이 끝이 없는 듯...지금 검색해본 영화 포스터들로는 매트릭스, 몬스터 주식회사, 어톤먼트, 더 엘프, 패닉 룸 등.. 하나 같이 다들 엄청 멋있는 모양새라 결제 버튼을 누르려는 손가락을 제지하려 무진장 애를 써야만 했다. 아유, 지금 마이너스 통장만 아니면... 아냐, 정신차리자. 적금을 부어야지 한푼이 아까운데 무슨 소리냐.
내 벽이 내 자아를 대변해주는 거라는 심오한 해석은 저만치 밀어둔다. 그저 내가 작업에 열중하다 문득 고개를 들면 멋진 사진들이 날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는 것. 그게 다 일뿐, 쓸데없는 의미부여는 외려 나를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기에. 자, 이제...이사를 갈 때가 되었다. 나만의 공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생의 장소로 떠날 준비가 되었다. (현실적인 준비는 지금부터!) 물론 이 사진들은 모두 떼어 내린 후 새집으로 가져갈 생각이다. 동시에 온전한 내 마음을 채워줄 것의 역활을 타인에다 두지 말자는 다짐을 한다. 바로, TMI 의 좋은 예다. 감사한 오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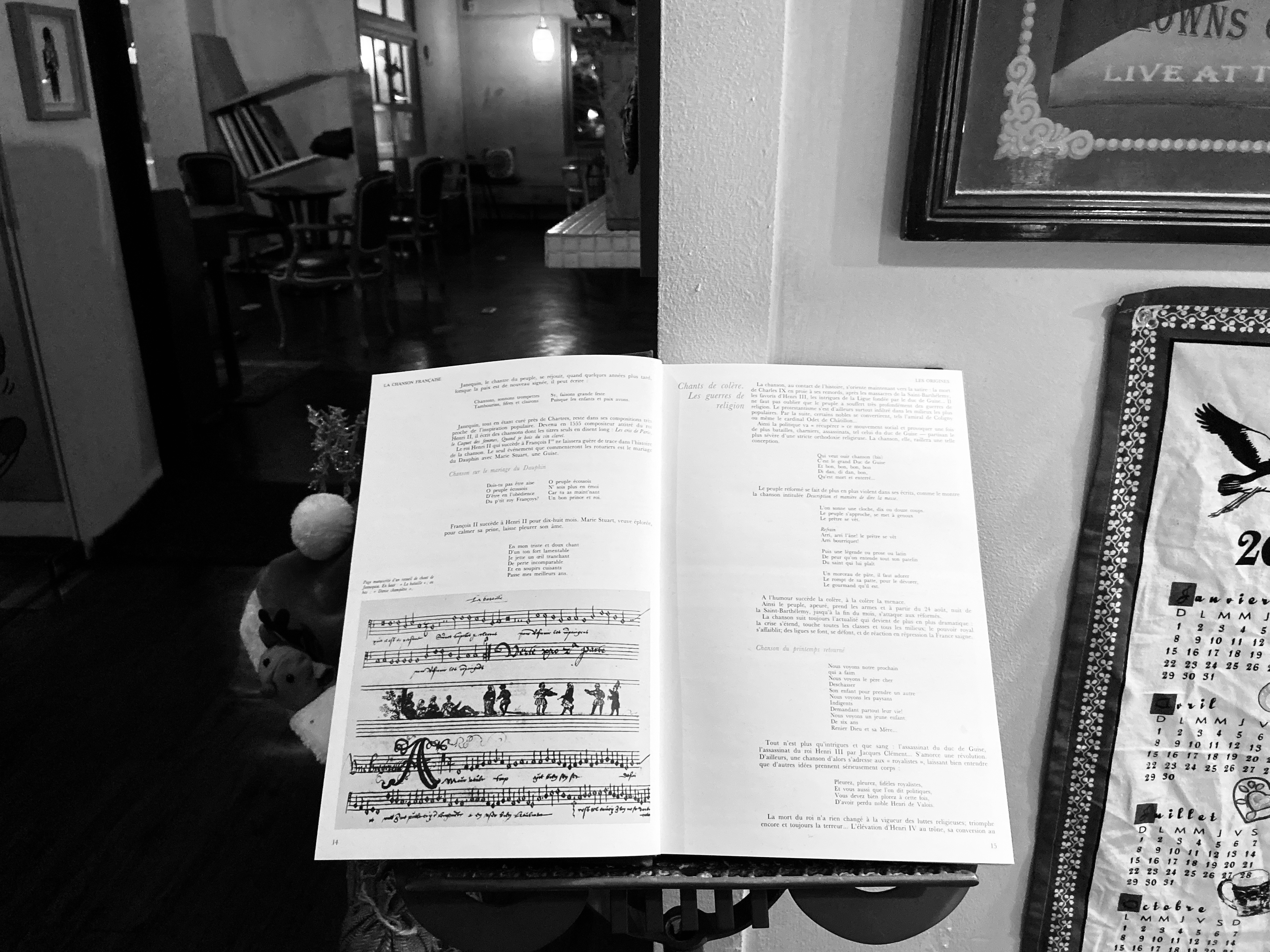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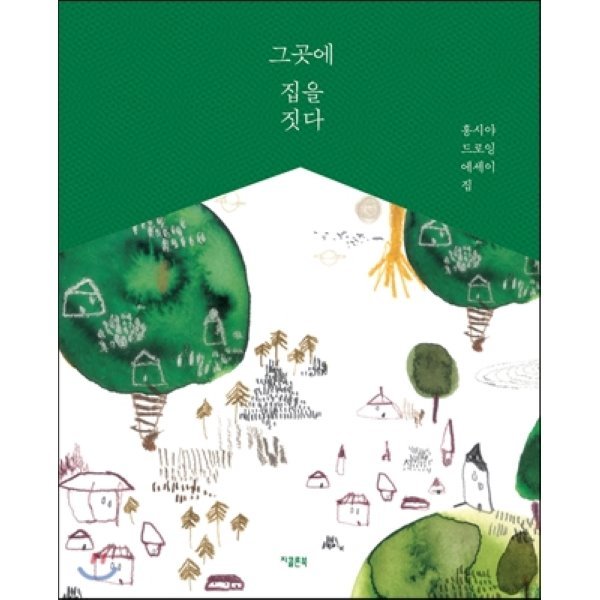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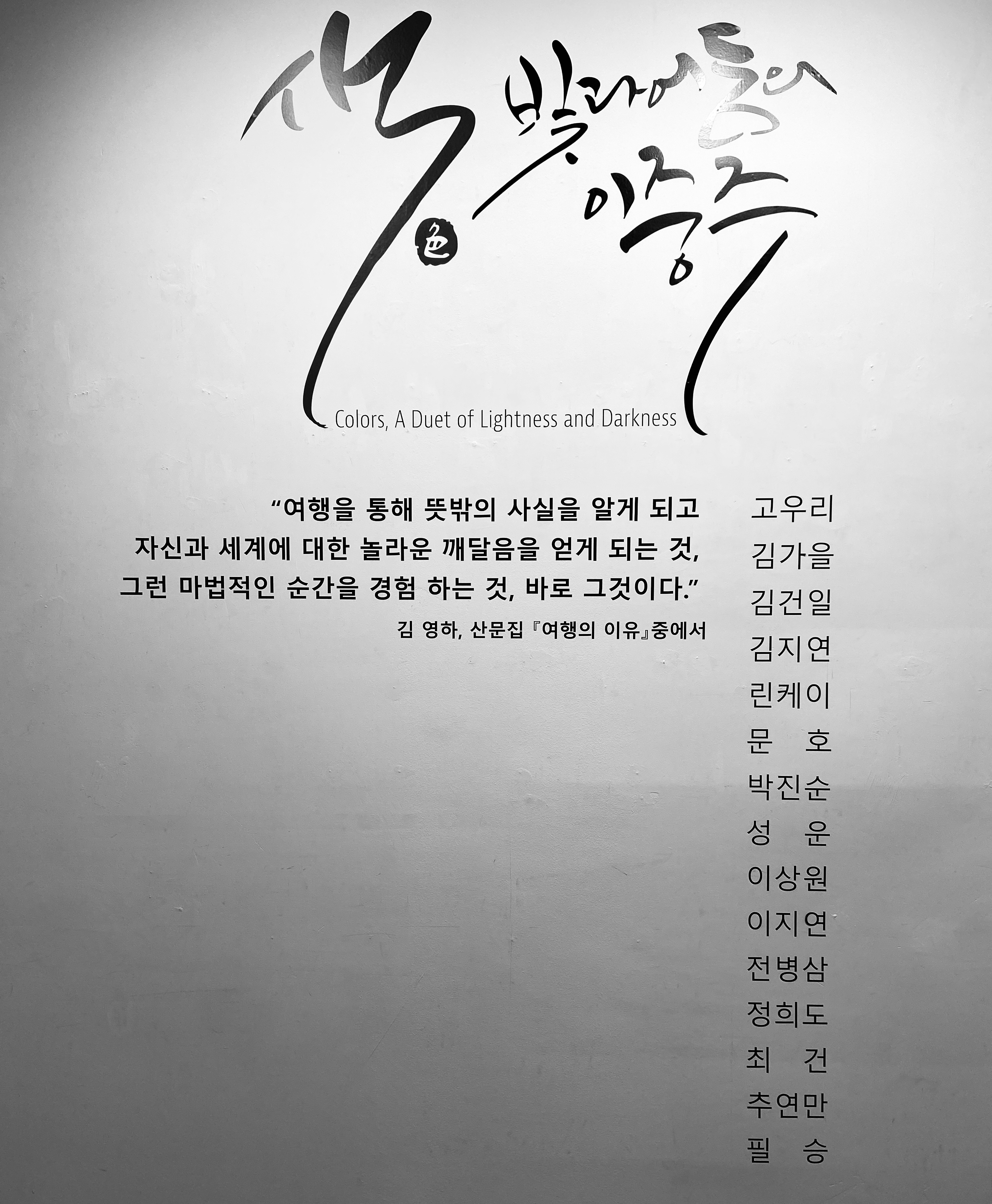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