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세이] 단편 생각 조각들 - 02

밤새 가위질을 했더니 손목에 적지 않은 무리가 왔다. 아주 오랜만의 가위질이라 서툴었지만 수십장의 사진을 오려내어 조각내는 일은 오히려 최근에 내가 성취했던 일 중 가장 보람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방문한 매그넘 파리는 아쉬움만 가득했으므로 곧 다시 방문할 예정이다. 텅 비었던 벽에 사진들을 주욱 붙여놓는 행위는 그 어떠한 영감을 넘어서는 당연한 일이기도 했으니.
포토그래퍼, 즉 사진가라는 직업의 무게는 그 자체에 중심이 얼마나 무거울지 지레짐작 하곤 했던 시절. 전엔 그렇게만 생각했었다. 전쟁이나 고아들의 사진을 찍어대는 돈에 눈이 먼 자본주의의 끝판 직업. 한 사진을 마주한 후 세상 설레는 경험을 한 며칠 전의 나는 더 이상 사진을 쉽게 볼 수도, 쉽게 생각 할 수도 없게 되었다.
내 주위는, 적어도 모두가 외로운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들 속 여러사람에게 미치는 '인연'의 의미란 각자 다르겠지. 예고 없이 왔다 가는 우연속 교훈들을 생각하게 된다. 늘 가장 쉬웠고 동시에 어려웠던 부분은 모두에게 진심을 다하는 것. 그래야 후회가 없기 때문인데 이것 또한 '적당함'은 필수이니 사람 관계란 참 쉽지 않은것 같다. 누가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내 삶엔 다른 어떤것 보다 '현명한 어른'이 필요하다.
이 글을 쓰는 도중 문자가 왔다. 누구일까? 괜시리 열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든다. 아직 잠에 들지 않은 파리의 누군가일까, 아니면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한국의 누군가일까, 그것도 아니면 한창 점심을 먹고 있을 미국의 누군가일까.
짧은 14일의 시간동안 만났던 그들에게 내가 느낀 몇가지는 어떻게 내게 딱 필요한 말들과 행동을 그릇에 담긴 물처럼 비춰주는 진실된 사람들을 만났을까, 였다. 그들의 많은 조언들은 여러번의 만남 동안 모든 것들은 내 머리와 눈에 담기고 흡수되었다. 그럴 수 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만남들이었다.
한국에서 일을 할때도, 여기서도 늘 고찰을 하는 부분은 '사람'이다. 나의 '일'과 '사람' 사이 경계선, 그 위를 아슬아슬하게 채워가는 내 삶이란 참 고달프지만 어떨땐 좀 숨통이 트이기도 하는 이상한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간은 감사한 일들이 넘쳐난다.
내 일은 내게 전적으로 권한이 있어야 한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갑질이 난무하는 요즘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앞에 선을 쭉 긋고, 여기까지가 제 바운더리니까 이 선을 넘을거면 제게 양해를 구하고 오시라 라고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생긴다.
'관계를 재설정' 해야 하는 타이밍이란 뭘까 생각하고 그에 깊이 공감하던 어느날 밤. 의미없이 그저 돈때문에 질질 끌려다니는 일방적이고 피곤한 관계란 과감히 재설정을 해야한다는 조언이 오갔다. 내 일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예를들어 공연을 하는데, 노래하는 도중 누가 와서 코드를 이렇게 바꿔서 연주해라 멜로디를 다르게 불러줘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다 갑질은 전혀 다른 세상 일이 아니고, 우습기만 한 상황은 아니란 말이다.
그저 파리에 다시 오겠다 하는 지나가는 말에, 어쩌면 며칠 후 기억도 하지 못할 사람들의 일시적으로 뱉은 말에 얼마나 많은 날들을 기다려왔는가. 거꾸로 생각해보면, 돌아가겠다 헛되이 약속한 나의 모습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 지금에야 깨달은 부분으로, 인연이란 내가 매달린다고 또한 놓고 싶다고 놓아지는 것이 아닌 듯 하지만.
한순간의 외로움을 참지 못해 상대방의 연민에 기대어 잠깐 채워지면 다시 돌아보지 않을 옅은 욕심을 부리던 때를 다시 회상하고 있다. 그 욕심이란 얼마나 가벼운 것이었던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내 자신에게 주었는가. 뻔히 보이는, 결국 나와 같은 사람일 그들의 말과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자면 다 부질없다 싶다. 더이상 귀엽게만 봐 줄수 없는 그 선을 넘는 조마조마한 순간을 즐길 수 없는 중2병의 일말의 후회다.
다시 태어난다해도 난 다시 나로 태어나고 싶다. 강에 비친 내 모습에 사랑에 빠져 죽은 나르시소스의 지나친 자기애까진 아니여도 충분히 내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끔 견딜 수 없이 공허하고 우울해 질때가 있는데, 하루라도 우울증약을 빼놓고 자면 바로 다음날 어김없이 효과가 나타나는건지 감정의 그래프가 스팀상장처럼 최고치를 찍었다 내려갔다 기이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글을 쓰고 싶지도, 먹고 싶지도, 노래하고 싶지도 않다. 그냥 음악을 듣거나 명상하고, 졸리면 자고 멍하니 벽에 붙은 사진들을 보는 일만 하며 며칠만 시간을 보내고 싶다.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고 싶지 않다. 일말의 기대감도 설렘도 미움도 기다림도 내 마음에서 지워버린 후 조용한 사랑으로 서서히 채워질 힐링의 시간을 갖고 싶다. 지쳤나보다..
오글거린다는 표현이 생기고 난 후 사람들은 진심을 순수하게 표현할 수 없게 되었다. 중2병이라는 단어가 퍼지고 나서 사람들은 더이상 자신들이 좋아했던 지난 세월의 낡은 음악들을 꺼내 듣지 않게 되었다. 감성도 아닌 갬성이라는 그 무언가가 사람들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눈이 피곤해져 오기에 글을 마치려다가 문자를 확인했다. 문자의 출저는 한국으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자러 간다는 친구의 내용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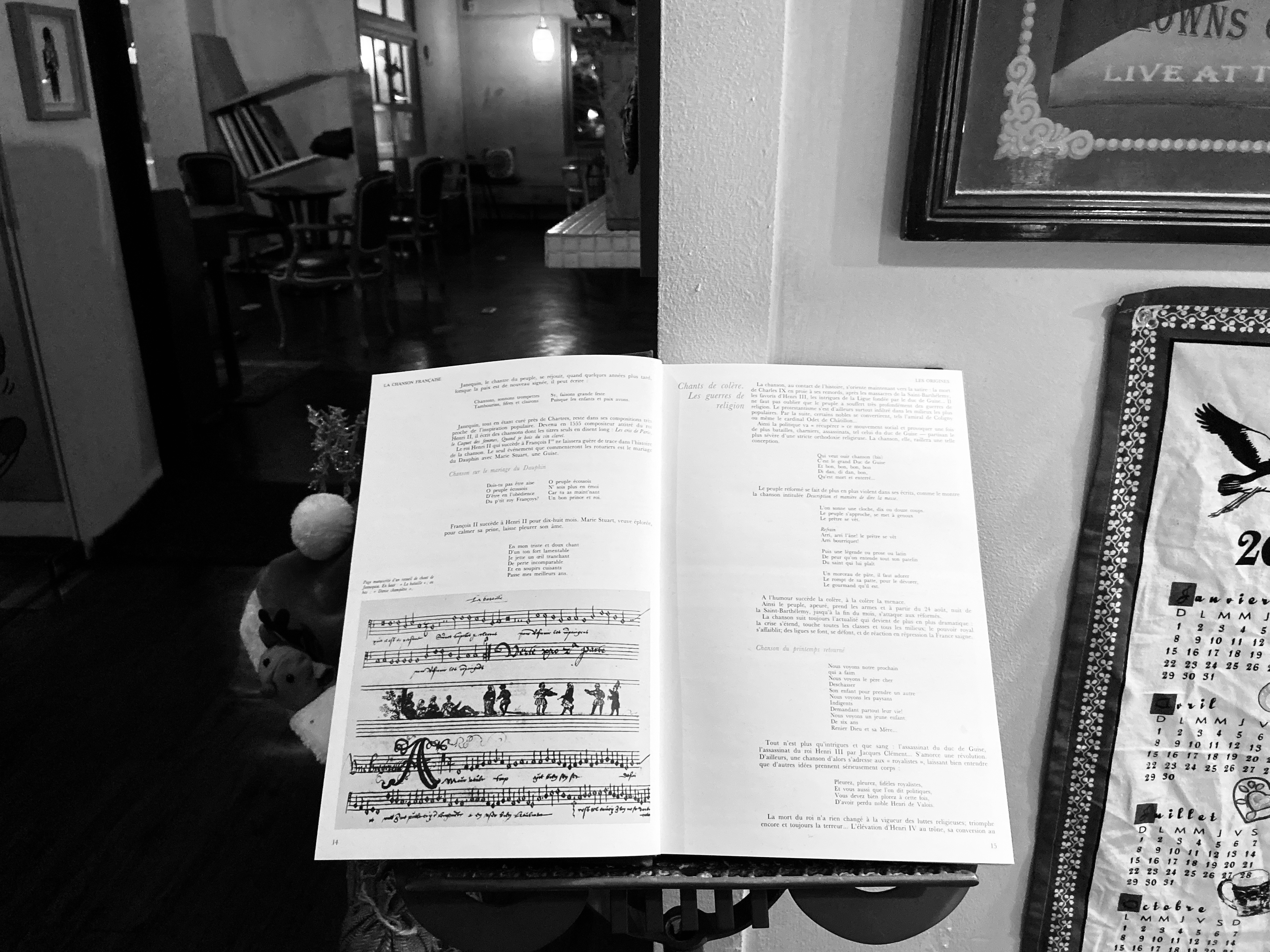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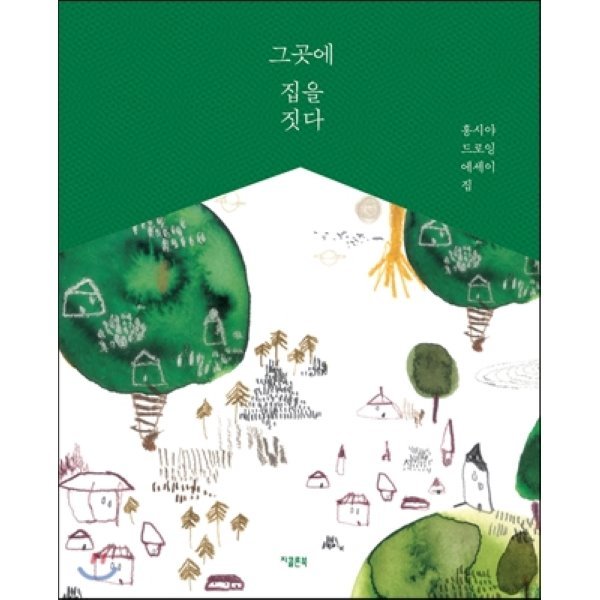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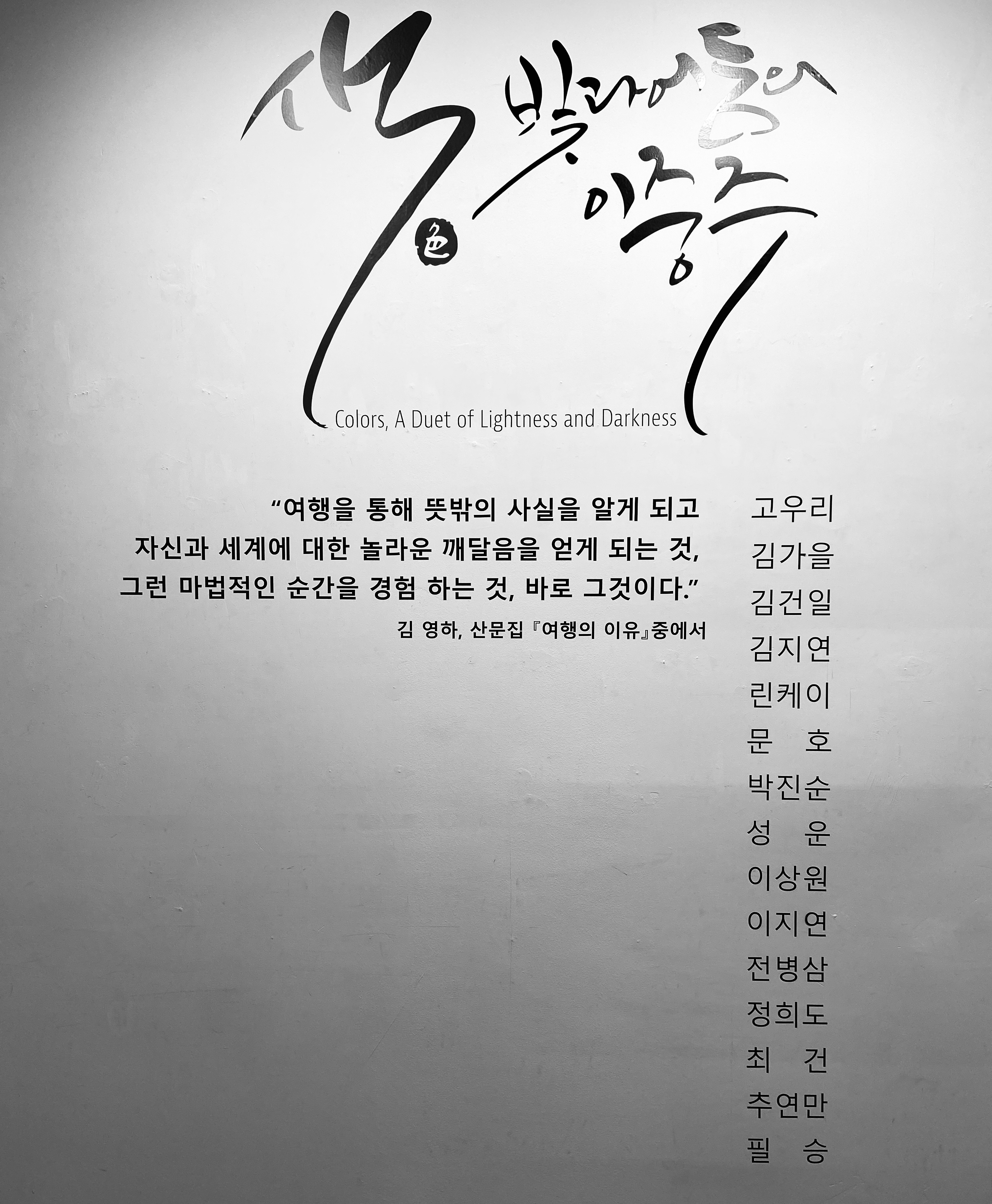


Comments